
휑뎅한 땅 위에 머리가 잘려나간 나무들이 시체처럼 놓여있다. 땅이 벌건 속살을 드러낸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년 된 아름드리 삼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던 제주 구좌읍 비자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꼽혔던 곳이다. 제주도는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겠다며 삼나무 915그루를 잘라냈다. 제주 비자림로 뿐일까. 인간의 더 많은 편의와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며 매년 전세계에서 650만 헥타르(196억평)의 숲이 사라진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도 인간이지만, 사라지는 나무로 인해 삶이 위협받는 것도 결국 인간이다. 미국 작가 리처드 파워스는 그런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700쪽짜리 장편소설 ‘오버스토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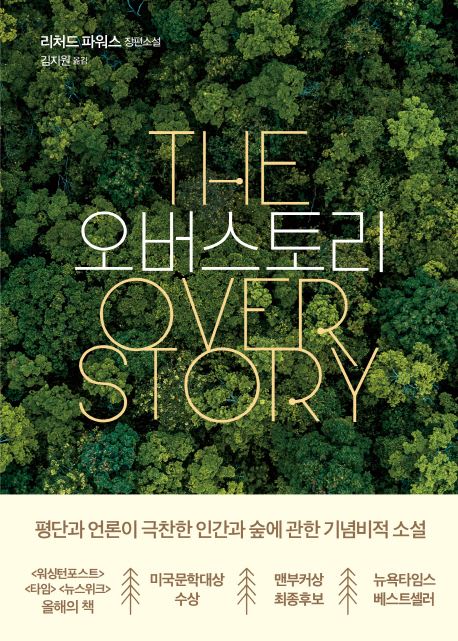
오버스토리
리처드 파워스 지음ㆍ김지원 옮김
은행나무ㆍ704쪽ㆍ1만8,000원
소설에는 저마다의 운명으로 나무와 얽힌 9명의 남녀가 등장한다. 100년간 밤나무를 찍은 사진을 상속받은 화가, 이민자 아버지에게 나무가 세공된 반지를 물려받은 엔지니어, 나무 위에 떨어져 살아 남은 뒤 갯벌에 묘목을 심는 참전 군인,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지만 나무와는 더없이 깊게 소통하는 과학자, 감전으로 죽었다 살아난 이후 나무의 소리를 듣게 된 대학생.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이들은 ‘나무를 지킨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운명처럼 연결돼 거대한 이야기 숲을 이룬다.
소설 속 인물들이 나무를 지키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의 마지막 남은 원시림 벌목을 막아내기 위해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수종을 보존하겠다며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게임 세계 안에 바깥보다 더 생생한 사이버 자연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망할 환경주의자”라는 비난과 맞서 싸우며, 말 그대로 ‘목숨’ 바쳐 나무를 지킨다.
미국 일리노이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저자는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우연히 만난 거대한 삼나무에 영감 받아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소설로 맨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미국문학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미국 북동부 그레이트스모키 산맥 기슭에 살고 있다. 소설 제목은 ‘숲 상층부의 전체적인 생김새’라는 뜻이다.

나무를 보지 않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딱딱한 소설은 아니다. 시적인 문체, 이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무에 대한 갖가지 은유 덕에 읽는 재미가 충분하다. ‘뿌리’ ‘몸통’ ‘수관’ ‘종자’로 이어지는 소설 목차도 깨알같다. 출판사는 소설에 ‘환경 서사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소설은 나무라는 자연존재에 대한 커다란 주석과도 같다.
나무를 위한 소설이 나무를 희생시킨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건 어쩐지 잔인하다. 읽는 내내 죄책감이 떨쳐지지 않는데, 다행히도 마지막 장에 다다르면 ‘이 책은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라는 덧붙임을 만나게 된다. 책 종이로 폐지를 썼다. 제작 과정에서 1g의 나무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칠거칠한 종이 재질이 소설 내용과 조응한다.
“아무도 나무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견과를 보고, 목재를 보고, 그림자를 본다. 장식품이나 예쁜 가을의 나뭇잎을 본다. 깨끗이 밀어야 할 어둡고 위험한 장소들을 본다. 하지만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 세상에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 절반이 남았다. 100년 안에 절반이 더 없어질 것이다. (…) 여기는 나무가 끼어 사는 우리 세계가 아니다. 나무의 세계에 인간이 막 도착한 것이다.”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작가가 독자에게 쏘는 일갈들이 뼈아프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면, 인간이란 종으로 태어난 죄 앞에 숙연해진다. 식목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이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고 다짐하게 된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