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 뒤 민중역사 집필 위해
전국을 돌며 고문서 빌렸지만
사업 해산으로 반납 없이 방치
31년간 계속된 반납 여행기 담아

“배불리 먹고 남자한테 기죽지 않아 좋아요.”
타타라 마을의 거대 제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하는 말이다. 거대한 풀무로 엄청난 열기의 불을 다뤄가며 문명의 상징인 철을 생산해내는 이 제철소를 가득 채우는 건 뜻밖에 여성들의 노랫소리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성들은 입 모아 말한다. 별다른 걱정 없이 잘 산다고. 오히려 눈치 보지 않아서 더 좋다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는 문명과 자연의 이항대립을 미묘하게 가로질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미묘한 지점은 하나 더 있다. 불, 철, 총 등 문명을 상징하는, 서쪽 저 너머에 있다는 타타라 마을이란 존재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그저 모두가 남자 탓이기에, 문명이란 대개 ‘남성적인 그 무엇’으로 그려진다.
타타라 마을에서 도드라지는 건 여성이다. 즐거이 노동하는 여성 일꾼들이 대거 등장할 뿐 아니라, 마을 지도자 또한 여성인 에보시로 설정되어 있다. 문명이 여성으로 표현된 건 페미니즘인건가, 여혐(여성혐오)인건가. 정치적 올바름 문제를 떼어내고 사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어색하다. 원령공주의 배경은 중세 일본의 변방이다. 사무라이는 칼 휘두르고 평민은 농사짓던 시절일 텐데, 여성이 제철소에서 쇠를 만든다?
타타라 마을은 당연히 미야자키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근거가 없을 리 없다. 바로 일본의 중세사가 아미노 요시히코(1928~2004)의 ‘해민(海民)’ 개념이다. 전통사회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 벗어난 해민은 전통적 중앙 권력이 장악하지 못한 민중의 삶을 의미한다. 자세한 얘기는 저자의 또 다른 책 ‘일본의 역사를 새로 읽는다’(돌베개)를 참고하면 된다.
아미노의 책 ‘고문서 반납 여행’은 그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료 수집 뒷얘기, 소장자나 연구자들과의 인연과 회한 등을 꼼꼼히 기록해뒀다. 그런 부분은 연구자들이 좋아할만한 얘기이고, 일반 독자에겐 해민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뒷얘기가 더 흥미롭게 읽힌다.
저자는 ‘제국주의 일본’이 싫어 일본 공산당에 가입했다. 패전 뒤 ‘상민(常民)’ 연구프로젝트에 뛰어든 이유다. 왕과 귀족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를 쓰기 위한 작업이었다. 발품 팔아 고문서를 모았다. “낡아빠진 쥐색 마대에 꽉 채워진 ‘폐지’나 다름 없던 문서들”을 찾아다 빌려다 필사하고 목록화하고, 읽어나갔다.
이 프로젝트가 몇 년 만에 무산됐다. 연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문서는 방치됐다. 약속만 믿고 집안 문서를 내준 이들은 연구팀을 ‘고문서 도둑놈’이라 욕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여행길에 올랐다.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31년간 진행된 ‘고문서 반납 여행’이다. 책은 그 기록이다. 재미있는 건 이 때부터다. 욕 먹고 뺨 맞을 각오로 시작했는데, 소장자들은 정중하게 맞아주었을 뿐 아니라, 더 큰 신뢰를 보냈다. 이 신뢰는 더 많은 고문서 제공으로 이어졌다. 그 덕에 저자는, 오히려 새로운 연구 방향을 뚫을 수 있었다.
가령, 일본 오쿠노토 지역의 도키쿠니 가문의 고문서를 조사할 때였다. 농지도 마땅찮은 변방 서부지대라 가난한 농민들이 겨우 먹고 살았다는 게 통설이었다. 그런데 7~8년간 이 집안 고문서를 꾸준히 읽어 나갔더니, 이 가문은 홋카이도에서 교토와 오사카에 이르는 광대한 해상 교역망과 광산을 운영했고, 염전과 숯, 연어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업의 비중은 미미했다. 논밭이 드문 척박한 땅이라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논밭을 갈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는 얘기다. 도키쿠니 가문 기록에서 미야자키의 타타라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사농공상(士農工商) 밖의 해민(海民)이란 그런 것이다.

#사농공상 밖에 있던
海民의 모습도 드러나
그렇기에 이 책은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게 해주는데, 그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민이 있었을까.
성리학의 조선은 오직 농업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제58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학술) 부문 수상작이었던 ‘조선의 생태환경사’(푸른역사)는 그 얘기의 집대성이다. 제목만 보고 ‘친환경’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조선시대 치열했던 농업개발의 역사다. 체제비판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였다.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휴머니스트)을 쓴 강명관 부산대 교수는 소설 ‘허생전’에서 허생이 섬에 들어간 뒤 배를 모두 불태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선을 비판한 연암 박지원과 북학파 또한 상업을 지향한 게 아니라 성리학적 농업의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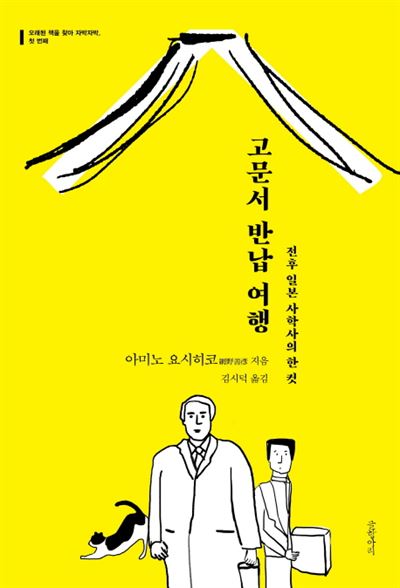
고문서 반납 여행
아미노 요시히코 지음ㆍ김시덕 옮김
글항아리 발행ㆍ264쪽ㆍ1만4,000원
앞서 언급한 도키쿠니 가문의 고문서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창고에 소중히 보존되어온 문서군과 원래는 파기되어야 했지만 우연히 맹장지(창호지)에 덧대어져 전해진 문서 사이에는 커다란 성격 차이”가 있었다. 소중히 보관된 문서에는 “논밭 중심의 공적ㆍ제도적 성격의 문서”가, 우연히 전해진 문서에는 “상공업ㆍ금융 등에 관한 사적ㆍ경영적 성격의 문서”가 많았다. 성리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일본에서 이런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면, 성리학이 더 강력했던 조선은 어떠했을까. 그 어딘가에 사농공상에서 벗어난 민중의 흔적이 잠들어 있을 지도 모른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