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언어, 팔짱언어, 동심언어. 이정록(54) 시인이 겹낱말(복합어)을 부르는 이름이다. 낱말과 낱말이 팔짱을 끼면 흥겹고 따뜻해진다. 물수제비, 나이떡, 지우개똥처럼. 낱말의 만남을 주선하는 건 순수한 마음, 동심이다. 코와 방귀(콧방귀), 사람과 멀미(사람멀미), 물똥과 싸움(물똥싸움)을 이어 붙여 새 뜻과 새 기운을 깃들게 하려면 아이처럼 천진해야 하니까. 이 시인은 겹낱말 316개의 사연을 316편의 시로 풀어내 시집 ‘동심언어사전’(문학동네)을 냈다. 1989년 등단한 그의 열 번째 시집이다.
“땅속에 박혀 사는 새가 있지./ 부리만 조금 내밀어/ 빗물과 눈송이를 받아먹지./ 구둣발에 차일 때가 많지./ 괭이나 쟁기에 으깨지기도 하지./ 울대가 없어서 삽날이 대신 울어주지./ 발로 찬 사람이 울어주지”(‘돌부리’ 부분) 아이의 마음은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 ‘돌부리’를 측은해한다. “사람은 두 눈으로 태어나지만/ 이제 천수천안관세음으로 살지./(…) 하느님도 부처님도 그만 쉬시라고/ 성전에도 딴눈이 돌아가지./ 이제 마음속 눈동자는/ 검은 관에 갇혀버렸지”(‘딴눈’ 부분) CCTV를 다른 곳을 보는 눈, ‘딴눈’에 비기는 건 딴눈들이 지긋지긋한 시인의 마음이다.
“늦었다는 생각을 싹둑 도려낸 사람,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마저 아낀 사람, 두려움을 설렘으로 감싸안은 사람, 뿌리 곳곳에 꿈을 쟁여두는 연뿌리 같은 사람…” 이 시인이 내린 ‘늦깎이’의 정의다. “웃는 아기의 꽃가루받이, 아픈 사람과 노인의 턱밑 낭떠러지를 지키는 것, 아픈 사람의 양지받이”는 뭘까. ‘턱받이’다. 이 시인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살아남은 복합어는 주로 배려, 위로, 연대, 재미의 말들”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복합어는 널리 퍼지지 못하니까요. 상대를 헐뜯는 복합어는 사멸돼요. 욕이 되고 말죠. ‘X새끼’처럼요(웃음). 민중이 오랜 세월 말을 가꾸고 말로 결속해 온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복합어의 ‘동심성’을 깊이 연구해 주기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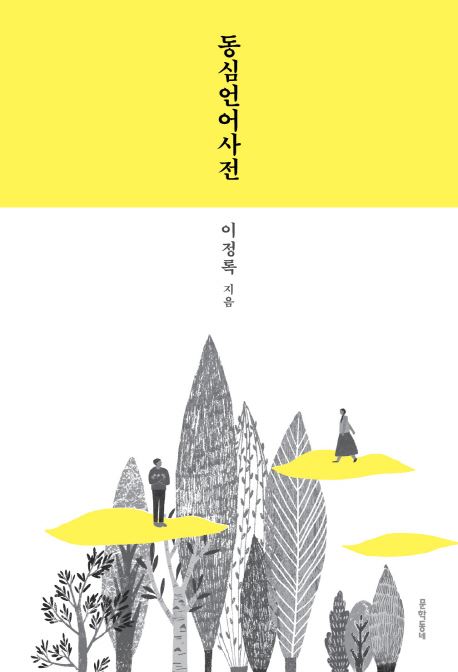
동심언어사전
이정록 지음
문학동네 발행∙428쪽∙1만6,500원
이 시인은 새 시집에서도 자연과 생태를 찬미한다. 황금을 욕망하는 인간, 이별이 숙명인 인간은 연민한다. “땅 투기꾼에게 넘긴/ 우리 밭,/ 망초꽃 한가득 피었다.// 망초꽃은 달걀꽃이라고도 부른다./ 노란 노른자에/ 흰자위를 두르고 있다.// 바라볼 때마다/ 엄마 아빠 눈에 흰자가 핀다.// 이제는 남의 땅,/ 땅값은 오르고 올라/ 진짜 노른자 땅이 되었다.”(‘노른자’ 전문) “지금은 한겨울,/ 겨울잠 자는 다람쥐들은/ 일분에 다섯 번만 숨을 쉴 거다./ 나는 다람쥐를 사랑한다./ 나도 숨을 꾹 참아본다./ 얼음판 걷듯 사뿐사뿐 걷는다./ 땅속에 다람쥐가 자고 있으니까./ 가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첫 겨울나기 하시니까.”(‘겨울나기’ 전문)
동정의 대상은 푸대접 받는 존재들에게 확장된다. “머리 떼고/ 똥 빼고 뭐 남느냐고?/ 한꺼번에 몇 천 개/ 알을 낳는 멸치의 아기주머니를 똥주머니라고 부르지 마./(…) 멸치는 똥이 없어./ 그물에서 똥 빠지게 몸부림쳤거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눈물처럼 내쏟았거든.”(‘멸치똥’ 부분) “죽을 때까지 모으면/ 왕딱지 두 장은 접을 수 있을걸.”(‘코딱지’ 전문) 평소 ‘아재 개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인을 닮은 쾌활한 시들이 시집 곳곳에 쉼터처럼 등장한다.
이 시인은 2016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500편이 넘는 겹낱말 시를 썼다. “죽을 때까지 쓴다.// 숨 끊긴 지 한참 지났는데,// 기필코 벌떡,/ 깨어나서 펜을 잡는다// 부스스,/ 유언을 퇴고하다가/ 다시 죽는다.”고 ‘글쟁이’를 정의한 이다운 용감한 속도다. ‘316편’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담았을까. “제 시집 ‘의자’(2006∙문학과지성사)와 ‘정말’(2010∙창비)의 시집 번호가 우연히 313번으로 같아요. 그래서 새 시집 수록작을 313편으로 추리려고 했는데, 편집∙교정 과정에서 세편이 실수로 남았어요. 그 시들이 절대 죽지 않겠다고 버틴 거죠(웃음). 처음엔 그 시들을 미워했는데, 어느새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가 됐네요.”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