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을 하늘의 신이 사슬로 묶어 땅으로 내려 보낸 존재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의 일이다. 밤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바람과 나무, 단단한 땅과 출렁이는 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던 이들은 밤하늘에 나타난 별자리가 타이가의 주인인 곰의 넋이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성대한 의식을 치러 고향으로 돌려보낸 곰의 넋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숲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곰을 데려온다. 새끼 곰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최근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맡겨진다. 새끼 곰은 딸이나 아들이라고 불리며 아이 잃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기도 한다. 사람이 사는 집에 살면서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곰을 데리고 가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사랑하고 보호한다. 몸집이 커지면 특별한 우리에 가두고 좋은 음식을 먹여 키운다.
곰이 두세 살이 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참가해서 곰의 넋을 돌려보내는 제의를 지낸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의 어느 날, 곰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마을 밖 공터인 제의 장소로 끌려간다. 슬픔과 흥분이 뒤섞인 긴장감 속에서 곰은 나무에 묶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발씩 쏘는 제의용 화살에 맞아 죽는다.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죽은 곰의 몸을 해체하고, 특별한 절차에 의해 요리를 만들어 잔치를 벌인다. 제의를 끝내면 사람들은 곰의 넋이 사람에 대한 우애를 간직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믿는다.
곰은 연해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우랄 산맥 너머까지, 그리고 베링 해협을 건너 북아메리카까지 널리 숭배를 받았다. 타이가에는 곰을 대적할 천적이 없을 뿐더러 숲 언저리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혼자 힘으로는 죽이거나 잡을 수 없었다. 겨울에는 잠들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존재였으며, 곰이 자주 출몰하는 시기의 타이가에는 열매, 짐승, 먹을 수 있는 풀이 넘쳐났으므로 풍요를 담보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곰은 타이가의 주인이자 털가죽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 곰은 친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곰은 사냥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털가죽과 고기를 얻으려 곰을 사냥했을 뿐 아니라, 능숙한 사냥꾼으로 거듭 나는 절차로 타이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사냥했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에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잡아먹으면서 사랑하고 보호했고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잡아먹었다. 사람은 그렇게 자연에 의존하고 그렇게 자연의 일부로 살아갔다. 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치르던 ‘곰의 넋을 돌려보내는’ 의식은 사람과 곰 사이의 대결과 모순을 해소하려는 장치였을 것이다.
나는 곰 고기의 맛을 알지 못한다. 내가 먹는 고기들은 모두 청결한 냉장고 속에서 차갑고 붉게 빛나고 있던 것들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들은 효율적으로 사육되고 효율적으로 도살된다. 언젠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소와 말,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의 형태나 기능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기계란 사람이 동물들과 나누던 관계의 복잡성과 모순을 삭제하고 효용만 극대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동물들도 이제 의지나 감정이 삭제되고 효용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
살아 있는 곰들을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방황하는 곰의 넋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따금 밤하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곰의 별자리를 찾아보고 있노라면, 스스로를 위로하듯 떠오르는 말이 있다. 모든 곰은 자신이 주인이다.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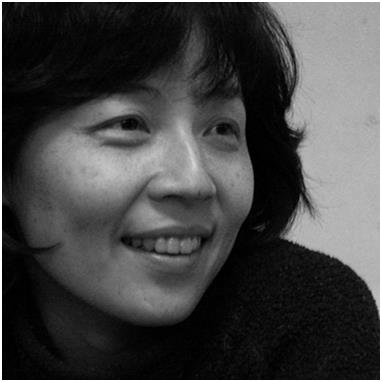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