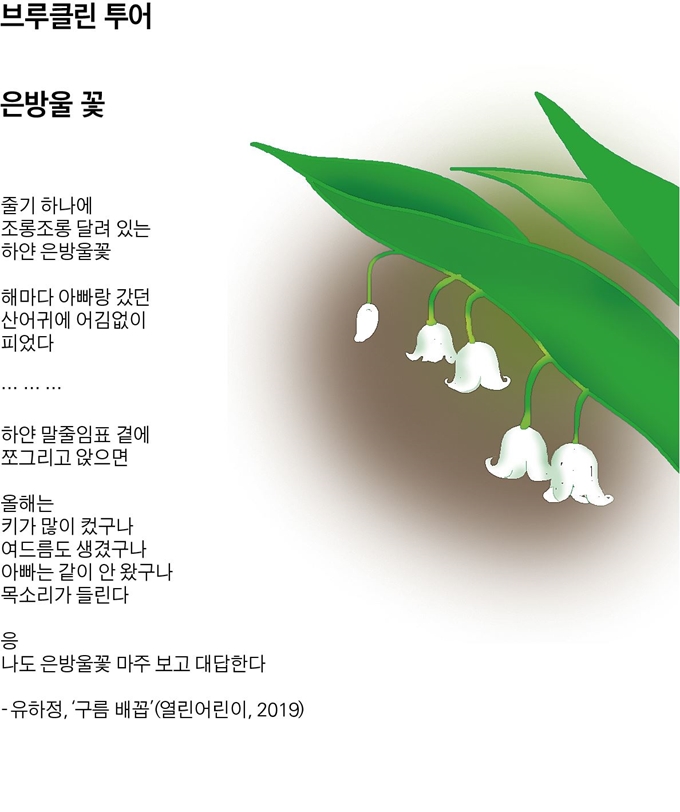
명절 앞둔 며칠이 꼭 태풍 전야 같다. 얼마나 센 비바람이 몰아칠지 숨죽이며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결혼ㆍ취업ㆍ자녀 출산에 관한 질문과 당부를 덕담 삼으며 올해도 그저 착한 손아래 사람으로 네네, 하하, 웃고 넘겨야 하나…. 온종일 꼬박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음식 준비, 상차림, 손님맞이는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만의 몫이 되는가…. 귀성길 차량 정체는 어쩌면 가장 맘 편한 축에 들지 모르겠다.
‘어른’들 앞에서 미혼(비혼), 미출산(비출산)은 미완성태로 취급받는다.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표준 모델에서 벗어나는 여러 종류의 삶에는 결여라는 도장이 찍힌다. 명절이란 게, 회사에서 진급을 심사하고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듯 온 집안의 ‘어른’이 모여, 누구나 애쓰며 찾아가는 저마다의 삶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벼르는 날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도 극심해진다. 나는 명절 가사 노동을 남녀 동등하게 분담하고 합심하는 집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만두를 빚거나 설거지도 한다며 평등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남녀 따라 밥상이 분리되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까지 달라지는 ‘양반’ 집안도 여전히 많다.
친구라면 내 삶을 왜 평가하냐 따지며 관계를 끊고, 사회에서라면 나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두 팔 걷고 투쟁할 텐데. 사랑하는 가족이니 설날 아침에 의절할 수도 없다. 걷어붙인 두 팔은 설거지통 속으로 들어가 기름때 묻은 그릇만 꽈득꽈득 문질러댄다. 가정에서 평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한 투쟁은 나 아닌 모든 적과 싸우는 각개 전투의 장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 적은 나를 키워준 부모이고, 나와 날마다 삶을 나누는 배우자이니 전투 앞에서 내 마음과 존재는 사방팔방 분열할 노릇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마음인 걸 안다면 아주 조금씩만, 서로에게 하얀 말줄임표 같은 은방울꽃이 되어주면 싶다. 내 푸른 줄기에 조롱조롱 달린 은방울꽃들 같던 식구들이 너무 소중해서 예쁜 꽃을 피우길 바란다 해도 이미 그 꽃은 내 꽃이 아니다. 한 줄기에 피어도 우린 모두 각자의 꽃이고 저마다 다른 은방울 소리를 낸다.
방울 방울 너울대는 소리는 말줄임표 속에서도 울린다. 내 사랑이 충분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줄임표를 두고도 내 사랑을 알아듣고, ‘응’ 대답하는 자기 긍정으로 행복할 텐데. 뒤늦게 당부하고 다그칠 게 뭐가 남아 있을까.
김유진 어린이문학평론가ㆍ동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