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도 지나고, 절기상으로는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立春)도 지나고, 긴 겨울도 이제 정말 끄트머리에 다다른 것 같다. 옷장 속 봄 옷을 뒤적거리기엔 아직 겨울 바람이 차가우니, 대신 시집을 뒤적거리며 미리 봄맞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든 계절에 읽어도 좋지만, 특히 봄을 기다리며 읽기에 더욱 좋은 시집을 출판사 시 담당 편집자들이 추천했다. 시집과 함께 봄바람을 재촉해보자.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김민정 시인ㆍ난다출판사 대표ㆍ문학동네 시인선 책임편집자

“한평생 몇 번이나 벚꽃을 볼까요” 이바라기 노리코 ‘처음 가는 마을’
이바라기 노리코는 세상살이에 표류하느라 사랑놀이에 눈치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놓칠 때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찾게 하던 시인이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란 시의 제목만으로도 우릴 글쎄 제 마음의 거울 앞에 절로 가 앉히질 않는가. 내가 가장 못생겼을 때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하고 당당 외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면 오랜 되새김 가운데 언제였더라? 하며 곰곰 침묵하게 되는 것이 아마 나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 되감기 같은 것이 시라는 것일진대 그 해냄을 특유의 솔직함으로 참 맑은 순수함으로 완수하는 시인이 이바라기 노리코이며 시집 ‘처음 가는 마을’에 그 정수가 꽤 담겼지 않았나 싶다. 겹겹으로 접어 불룩해진 이 시집을 들고 벚꽃 보러 가는 봄이어야지 마음먹은 데는 이 구절들의 힘이 컸다. “사람은 한평생/몇 번이나 벚꽃을 볼까요/철들 무렵이 열 살이라고 한다면/아무리 많아도 칠십 번은 볼까/서른 번 마흔 번 보는 사람도 많겠지/너무 적네”(‘벚꽃’) 너무 적네, 그건 어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와 비등한 말이기도 할 터… 횟수가 뭣이 중하냐면 재미니까, 삶이라는 ‘사랑스런 신기루’를 견디기 위해 시로 이런 재미 좀 쏠쏠했으면도 싶으니까.
◇서효인 시인ㆍ민음사 한국문학편집부 문학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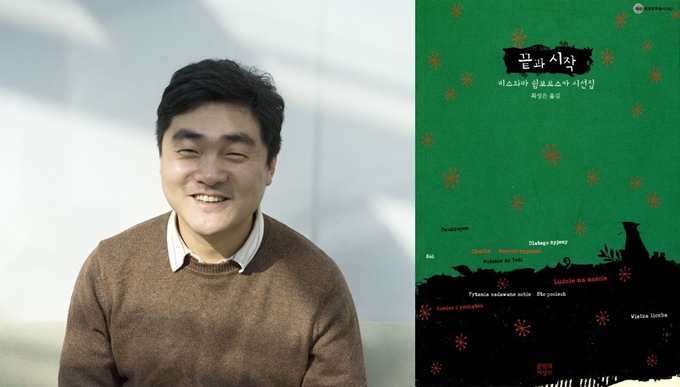
“단 한 번의 봄날을 위해” 폴란드 시인 비스바와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
“두 번은 없다.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겨울을 끝까지 온몸으로 통과하고 나서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끝에는 시작이라는 게 함께한다. 계절은 끝과 시작이 맞물리며 반복되는 돌림노래 같은 것이고, 이는 한낱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물리적 순환이지만 우리는 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것의 구와 절을 나눈다.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시어(詩語)일지도 모른다. 그 중 봄은 시라는 노래의 첫 소절에 해당하겠다. 1년의 수학적 시작은 삭풍의 1월을 지닌 겨울이겠지만, 생체적 시작은 아무래도 봄일 테니까. 새 학기, 새 직장,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랑… 새로운 모든 시작은 대체로 봄에 어울린다. 이것들 모두가 반은 설레고 반은 두렵다. 단 한 번뿐이니까, 두 번은 없을 테니까. 동그란 지구가 둥그런 태양을 돌면서 발생시킨 단 하나의 봄날이 다가온다. 쉼보르스카의 시와 함께라면, 두 번은 없어도 좋을 봄날이 될 것이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다.
◇박준 시인ㆍ창비 한국문학팀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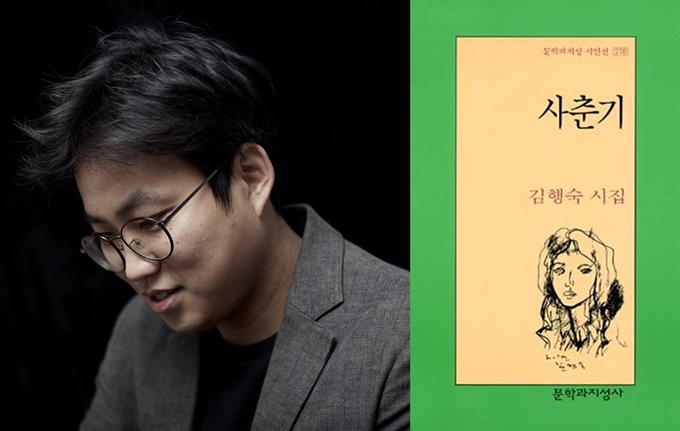
“미움의 기록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김행숙 ‘사춘기’
어떤 책을 펼치면 그것을 처음 읽었을 때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한다. 내게는 ‘사춘기’가 그중 하나다. 그때 나는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잔디밭이었지만 잔디가 채 자라나지 않아 그곳을 찾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만약 잔디가 푸르게 자라나 있는 상태였다면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내가 ‘사춘기’를 처음 읽은 곳은 다른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 봄에 나는 유독 나를 미워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없었다. 은둔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시집을 읽는 것이 당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둔이자 가장 긴 외출이었다. ‘사춘기’를 읽고 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미워했지만 이러한 일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그 미움의 기록이 높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배웠다. 생동이 갱신에서 오는 것이라면 갱신은 미움 끝에서 생기는 반성에서 올 것이다. 스스로를 미워해도 좋을 봄이다. “나는 더 멀리에서 나타나고 싶다. ‘주어지지 않은 역사’이므로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알았던 것에 기댈 수 없을 뿐이다. 그리고 다만, 나의 무지의 힘으로 으으으 달릴 뿐이다.”(‘사춘기’ 표4글 중에서)
◇이민희 문학과 지성사 편집1부(한국문학)팀장

“막 움트는 새싹 같은 문장” 이제니 ‘아마도 아프리카’
“온 힘을 다해 살아내지 않기로 했다.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 (…)너는 긴 인생을 틀린 맞춤법으로 살았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 ―’밤의 공벌레’ 부분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전 이제니의 시를 처음 만났다. 엄밀히 말해 온 힘을 다해 살아내지 않던 때였고 긴 인생을 산 것 역시 아니었으나, 당시 내겐 엄정한 잣대보다는 마음 어디쯤을 짚어줄 소소한 면죄부 같은 문장 한 줄이 필요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전 먼저 다가온 문장들이 있었다. 이제니의 시들은 꼭 울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옆에서 함께 달리면 되는 거였다. 이제니는 매번 조금씩 더 나아가려고 한다. 시인과 나는 두 권의 시집을 함께 작업했다. 지난 두 시집에서 심어둔 질문들을 하나씩 수확해내듯, 올해 첫날 출간된 세번째 시집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은 첫 시집보다 깊고 두번째 시집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보다 훌쩍 실험적이다. 마치 세 권의 시집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레 흐르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봄을 생각한다. 막 움트는 새싹 같은, 이해하기 전에 느껴지는 문장들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시작이, ‘아마도 아프리카’에 있다.
◇이윤정 현대문학 월간지팀 과장

“지금, 같이 있는 순정한 이 기쁨” 박상수 ‘오늘 같이 있어’
기상예보와는 달리 올겨울은 큰 추위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봄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함없이 돌아올 봄을 위해, 부지런히 읽고 쓰는 평론가-시인 박상수의 ‘오늘 같이 있어’를 골랐다. 여성적인 언어로 시대의 풍경을 발랄하고 씁쓸하게 그려온 시인의 세 번째 시집으로, 새해 다짐처럼 서툰 사회 초년생들의 ‘웃픈’ 현실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연노랑 커버로 몸을 감싼 이 시집은 “막 볕이 들 때의 테라스에서 레몬케이크를 한 입” 맛볼 때의 기분과 “소금맛 생강맛 치즈맛 몽땅 섞인 이상한 쓴물”을 삼키는 기분이 묘하게 교차하며 안배돼 있어 재미있고도 낯설다. 그 희극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맞닥뜨리는 부조리한 현실과 크고 작은 폭력들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들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세계를 응시하게 만들며, 그만큼 시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벚꽃 엔딩’과 ‘봄이 좋냐’가 뒤섞여 울려 퍼질 우리의 상투적인 봄 풍경 속에서, 박상수 시인의 ‘오늘 같이 있어’를 읽으며 지금껏 몰랐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지금, 같이 있는 순정한 이 기쁨”을 누려보기를 권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