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를 자행하면서 공식 문서나 성명서에는 ‘특수치료’로 표현했다. 그 어디에도 히틀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은 줄곧 소리친다,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서 나치의 조직적 학살이나 가스실 같은 처형시설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보상금을 노린 유대인들의 괴담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희생자는 ‘많아야 150만명’이라면서도 도통 거리낌이 없다.
□ “팔에 수감번호가 새겨진 생존자에게 ‘숫자 문신을 해서 돈 많이 벌었겠다’고 말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허황된 주장을 ‘수정론자의 의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있다.” 홀로코스트 연구의 권위자인 데보라 립스타트의 일갈이다. 그는 “논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나면 ‘진실’ 침해에 나선다”고 경고한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위안부를 자발적 성매매로, 징용 논란을 후손들의 돈 욕심으로 몰아붙인다. 심지어 일본이 10년 전(이명박 정부를 염두에 둔 듯)부터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졌어야 한단다. 그들은 지금 엄연한 대한민국 학계의 일원이다.
□ 저자들은 통계와 숫자로 중무장했다. 실증했다는 결론.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고, 덕분에 미개한 나라가 근대화됐다. 그런데도 반일 종족주의에 찌들어 있으니 오호통재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던가. 학계에 ‘검은 사제들’은 차고 넘친다. 이른바 ‘벽골제 논쟁’을 비롯해 저자들의 금과옥조인 조선총독부 통계의 미비, 근거 박약한 보정의 반복, 자의적 해석 등은 이미 숱하게 지적됐다. 일부는 뒤늦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환호하지만 맹신은 깨진 지 오래다.
□ 뉴라이트 운동의 좌절 탓인지 목차부터 도발(dobal)의 정점이다. 식민지배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 치자. 그 과실을 누가 누렸나. 영구 병합을 위해 ‘근대적인’ 법ㆍ제도를 이식해왔으니 일본의 차별ㆍ억압이 심했을 리 없다는 말인가. 흐릿하고 때로 일관성도 부족한 ‘기억’은 죄다 거짓인가. 모든 해석에는 가치관이 투영된다. 저자들에게서 천박한 역사의식 이상을 읽어낼 수 없는 이유다. 실증을 아픈 역사에 가하는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과 똑 닮았다. 추신: 기자 책읽기의 요체는 밑줄 긋기가 아니라 ‘총체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양정대 논설위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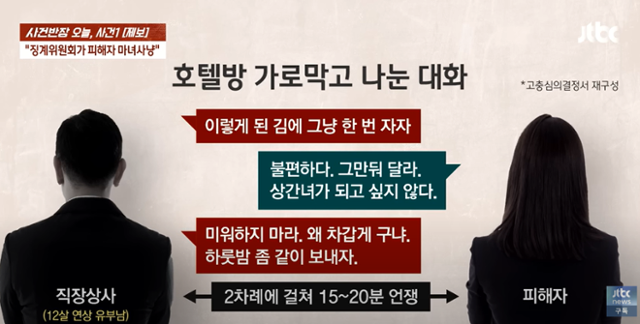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