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4주마다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26>권정생 ‘빌뱅이 언덕’

나는 간곡함으로 호소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선동하는)’ 작가에게 약하다. 취향이다. 그런 글을 보면 몸이 뜨거워진다. 영혼이 꾀죄죄해졌다고 느낄 때, 정신의 혈관이 꽉 막힌 것처럼 갑갑할 때, 내가 찾는 작가는 둘이 있다. 외국 작가로는 존 버거, 한국 작가로는 권정생이다.
권정생(1937-2007). 아마도 동화 ‘강아지똥’의 삽화 이미지 때문이겠지만 그를 떠올리면 흙색의 순한 얼굴을 한 작은 ‘생강인형’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 속 생강인형은 순하고, 착하고, 빛나고, 외롭고, 닳아있고, 뭉툭하니 못나고, 여린 가운데 쌩쌩한 힘을 가진 존재다. 생강 인형의 얼굴은 영락 없이 권정생의 얼굴이다. 나는 그의 얼굴이 좋아, 부러 인터넷으로 검색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한다. 흰 셔츠, 모자, 고무신, 작은 집 따위를 나무 바라보듯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순해진다.

20대 때 권정생의 산문이 수록된 ‘빌뱅이 언덕’과 동시 몇 편을 품고 살았다. 뭐가 좋았냐고 묻는다면 글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좋았다. 그가 쓰는 언어는 쉽고 단순한데 생각은 곡괭이처럼 힘이 세다. 유연한 정신에 길을 내기 딱 알맞다(딱딱한 정신은 어려울 수 있다). 정성으로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게 권정생의 스타일이다. 읽는 이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각의 자장에 휘말리게 한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어른들에게도 읽히는 것은 아마 한국인이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을 주제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17쪽)
‘강아지똥’이나 ‘몽실언니’ 같은 동화는 물론, 그가 쓰는 산문과 동시 어디에도 영웅서사나 찬란한 이야기는 없다.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슬프지만 어둠의 끝까지 가진 않는다. 슬픔 너머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주목한다.

권정생의 글에는 가짜나 모조품이 없다. 으스댐이나 설익음이 없다.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성정은 청렴하고 깊다. 끊임없이 타자를 생각하는 일, 어떤 글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지만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을 쓰는 일. 이런 특질은 위대한 작가라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훌륭함’에 ‘간곡한 마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의 잣대에서 그의 스타일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핀잔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의 걱정, 전쟁과 부의 불평등 등을 걱정하는 대목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글을 읽고 우리를 돌아볼 때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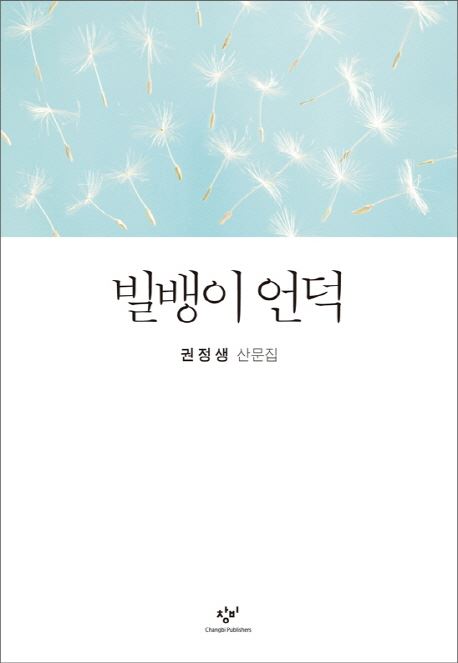
빌뱅이 언덕
권정생 지음
창비 발행ㆍ364쪽ㆍ1만5,000원
“평화란 적당히 고루고루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인간은 불행한 동물이다. 아직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들은 사재기 같은 것을 할 줄 모른다. 태어날 때의 모습 이상으로 꾸미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 본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꾸미고 속이고 허세를 부린다.” (218쪽)
“적당히 고루고루” 살아가는 일, 이게 참 어렵다. 권정생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죽은 뒤 어린이들을 위해 남긴 돈(평생 모은 인세)이 10억이 넘었다고 해서 놀랐다고 한다. 진짜 가난한 게 뭘까? 그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뜰에 햇빛과 먼지를 모으는 사람처럼 돈을 모았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부자, 부자인 가난뱅이였다.
‘빌뱅이 언덕’을 읽으며, 가난한 교회 종지기로 살던 젊은 날 그의 모습을 그려본다. 방안으로 들어온 쥐들이 추울까 봐 내쫓지 못하고, 같이 지냈다던 마음을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도 때 타지 않는 게 있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박연준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