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한일 양국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발표를 하자 많은 이들이 탄식했다. 대독(代讀) 사과라는 형식, 국가의 주범 역할 인정을 우회하는 어휘, 그리고 무엇보다 1993년 고노 담화에도 담겨 있었던 연구와 교육 약속이 빠진 사실이, 부모 손에 이끌려 억지로 쓴 어린이 반성문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미디어에는 독일이 등장했다. 보아라, 선진국 독일은 깨끗이 사죄하고 지금도 열심히 2차대전 유대인 학살 전범들을 단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독일이 나온다. 외교무대는 어차피 국력이고 이 정도면 정부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가만히 있으라. 미국을 쥐고 있는 강자 유대인에게만 사죄했을 뿐, 나미비아 식민지의 학살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망각 속으로 밀어내고 방치했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은 덜 단순해서, 독일이 도덕군자였던 것도 강자 앞에서 알아서 설설 기었던 것도 아니었다. 2차대전 직후부터 유대인들은 독일에게 홀로코스트를 배상시키도록 승전국 각국에 정식 요청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후에는 국가로서 계속 배상청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정식 사과도 받고 용서도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미결 범죄를 발굴해내며 개별 사안들에 대한 정의 구현을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의 근간이 된 것은 바로 사안의 기억을 남기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었다. 박물관과 연구의 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발굴 보도와 서사 작품의 역할이 컸다. 누구도 외면하고 덮어두지 못할 만큼 역사적 비극을 열심히 알리며, 걸작만화 ‘쥐’의 사례처럼 점차 피해자 내러티브를 넘어 근대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었다. 이런 진지한 탐구에는 독일 지식인층들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했다. 국력이 강해서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이들이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기를 쓰고 이슈화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에 가깝다.
나미비아 헤레로족 학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미비아가 1990년에야 독립국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정부가 오랫동안 야당지지 소수 부족인 헤레로족의 사연을 외면했기에, 즉 제도적 노력과 이슈화를 할 여력이 없었기에 묻혀있던 사안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여 2001년에 미국에서 소송을 걸자, 2004년에 독일 정부의 사과가 나왔다. 그리고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미비아 정부도 나서게 만들었고, 마침내 2015년에 독일정부가 ‘민족학살’임을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싸우는 이들이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이슈화를 시켜내는 것이 미디어의 몫이다. 계속 소송을 걸고, 계속 연구하며 복합 섬세한 이야기들을 길어 올려서 널리 소통하여 도저히 잊어버릴 수도, 대충 넘길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것 말이다. 그 중 정부가 자기 몫을 못한 만큼, 미디어가 할 일만 어쩔 수 없이 늘어났다.
미디어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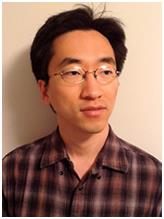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