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투표에서 유권자 4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 대선(투표율 75.8%)보다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하니 최종 투표율을 80%로 가정하면 투표자 3명 중 1명이 이미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이다. 연휴가 길어 미리 투표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4명 중 1명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찍으려는 후보가 있으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이었다.
▦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고 그렇다고 투표 거부를 유권자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과 어울리는 후보를 골라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누드 대통령’(nudepresident.com) 같은 사이트는 경제, 교육, 국방, 노동, 복지, 산업, 외교안보 등의 질문에 답하면 10분 만에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언론사들이 만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도움까지 받아 적당한 후보를 고른다고 해도 현재 최다 득표자 선출 방식으로는 대표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1987년 13대 이후 투표자 대비 대선 당선자 득표율은 탄핵 당한 박근혜(51.55%)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반수를 밑돌았다. 김영삼, 김대중은 40%를 간신히 넘겼고, 노태우는 36% 남짓에 불과했다. 과반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었다. 심지어 전체 유권자수로 따지면 당선자 지지는 모두 30%대다.
▦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지 않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대선을 치른 프랑스처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 놓고 한번 더 투표 하는 결선투표제가 있다. 이 제도는 소수 정당 후보의 입지를 넓혀주고 정책 대결이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비용이 든다. 지지순서대로 아예 순위를 매겨 투표용지에 적어내는 선호투표제도 있다. 선호 1위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를 탈락시키고 탈락 후보를 1위로 매긴 표의 2위 후보자에게 그 표를 더하는 방식이다. 투표와 집계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긴 하다. 이번에 여러 후보가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이 추진된다면 대선 제도 개선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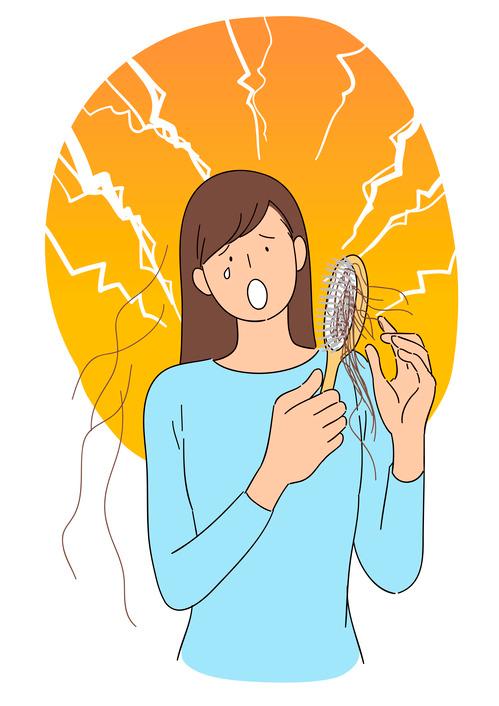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