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알파고와 대국하며 배워
딥러닝은 인간도 하고 있었던 셈
AI분야 발전 속도 빠르지만
이제 막 출발점에 서 있을 뿐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 기우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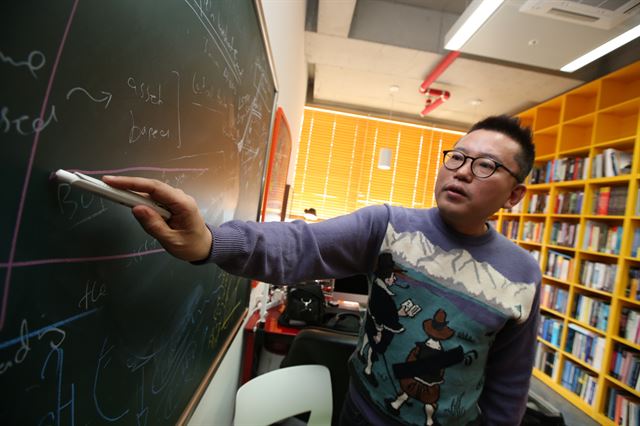
김대식(47)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알파고 덕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각종 인터뷰, 출연, 기고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1시간 단위로 이런 저런 약속을 쪼개 쓰고 있었다.
김 교수는 14일 연구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내 연구도 하고, 책도 써야 하는데 알파고 때문에 벌써 5월까지 모든 일정이 다 차버렸다”며 웃었다. 하지만 인터뷰 질문을 던지자마자 피곤한 얼굴은 사라지고 AI의 미래에 대한 열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청소년 시기부터 독일에서 생활한 그는 대학 시절 AI에 관심을 가졌고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뇌과학으로 석ㆍ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MIT에서 박사후과정을, 일본 이화학(RIKEN)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미 미네소타대, 보스턴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 뇌과학과 철학, 역사 등을 접목한 저서 ‘김대식의 빅 퀘스천’과 여러 대중강연으로도 유명하다. 인터뷰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세돌이 4국에서 알파고를 이겼다. 어떻게 봤나.
“너무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 같아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다. 이세돌이 지고 있는 동안 유럽 매체에 나온 판후이 인터뷰 기사를 쭉 봤다. 지난해 대국 이후 판후이는 알파고와 계속 협력했다. 흥미로운 점은 판후이가 “대국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딥러닝은 알파고 뿐 아니라 인간도 하고 있었던 셈이다.”
-3패 뒤 1승이란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배운 결과인가.
“나도 바둑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네 번째 대결에서 이세돌의 스타일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대결은 ‘기계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느냐’였는데, 이제는 ‘인간이 기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 15일 마지막 대국은 그럼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승부다.”
-관계가 역전된 셈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딥러닝은 결국 인간 뇌를 모방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세돌이 명품이고, 알파고는 짝퉁이다. 다만 18번째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막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이번 대결 덕에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사실 AI는 1950년대 이후 실패의 연속이었다. 수학적 알고리즘과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덕택이다. 눈길을 끄는 건 기술의 발전 속도다. 2006년 이후 AI 관련 알고리즘들이 수학적으로 해명됐고, 2012년 마침내 딥러닝이 가동됐다. 그런데 2013년 얼굴 인식에서 기계가 사람을 뛰어넘더니 2014년 사물 인식에서도 역전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섰다. 당분간은 이런 사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상용화가 눈 앞에 온 셈인가.
“예전엔 100~200년 뒤 얘기였다면, 지금은 최소 30~40년 뒤의 얘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수 알파고’와 ‘기자 알파고’가 접속해 기사를 생산해낼 날도 멀지 않았다.”
-디스토피아인가. 작게는 정치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더 크게 반영되리라는 전망에서, 크게는 인류 절멸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역사를 보자. 증기기관으로 상징되는 산업혁명 이후 기존 직업의 80%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디스토피아인가? 거꾸로 우리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대부분은 평생 글도 못 읽고 머슴으로 뼈빠지게 일하다 마흔쯤에 죽었을 것이다. 흙수저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 중산층 삶의 수준은 300년 전 황제 수준보다 훨씬 높다. 그럼 지금은 유토피아인가? 중요한 건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어떻게 콘트롤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하느냐다.”
-그러기엔 AI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기에 냉철한 대응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AI 덕에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제도 등 시스템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미 북유럽쪽에서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다. 그에 반해 미국은 더 다양한 직업이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쪽에 기댄다. 개인적으론 이 두 가지 모델이 섞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사실 ‘약한 AI’다. 자율성을 지닌 ‘강한 AI’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미국 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얘긴데, 솔직히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약한 AI와 강한 AI간 간격이 단절이냐 연결이냐를 두고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인문학쪽은 아무래도 ‘인간성’ ‘자유의지’ 같은 걸 내세워서 단절로 본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뇌과학쪽은 연결쪽에 무게를 둔다. 뇌과학에서 영혼이나 자유의지는 특출난 범주가 아니다.”
-‘김대식의 빅 퀘스천’에서 영혼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38억년 생물체 진화의 결정체인 1.8㎏의 뇌를 인간이 모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이점은 과대망상이다고 하는 반론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책 제목이 ‘빅 앤서’가 아니라 ‘빅 퀘스천’이다. 다만 이런 얘길 하고 싶다. 약한 AI만으로도 사회는 크게 변한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는 자동차를 조심하지,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진 않는다. 약한 AI가 자동차라면 강한 AI는 비행기다. 일단 약한 AI 문제에 냉철하게 집중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통제가 관건이다.”
-AI 연구 활성화 방안이 거론된다. 필요한 게 뭘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냄비근성이 아니기만을 빈다. AI 분야도 막 두기 시작한 바둑이다. 아직 판이 열려 있다.”
대전=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