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기억이 거래되는 시장을 알고 있다. 놀랄 일은 아니다. 어쩌면 오늘도 한 끼의 식사와 저 등불의 쾌락과 잊고 싶은 사랑을 위해 나는 기억 한 토막을 팔아버렸는지도 모른다. 눈치챘겠지만, 이 거래의 함정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을 위해 어떤 어제를 버렸는지. 어떤 순간을 지우고 어떤 약속을 내팽개쳤는지. 그러나 정말 모를까? 만약 살아가는 일로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면, 김성중의 ‘국경시장’을 읽더라도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다. 그의 이야기에는 애써 현실에 빗대지 않더라도 서늘하고 쓸쓸해서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 낮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하는 이별 통보를 듣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짜 같은 현실에서만 꿀 수 있는 진짜 같은 꿈일지도 모르니까.
이를테면, 몸이 한껏 투명해져서 깊은 곳에 숨겨둔 욕망이 훤히 비치고, 고스란히 새겨진 재난과 실패와 상처의 흔적조차 관능으로 꿈틀거린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킹코브라가 고독한 몸짓으로 주위를 맴돌거나(‘동족’), 생활의 곤혹 탓에 멀리까지 떠밀린 친구가 ‘곰 모양의 유리병’(‘관념 잼’)으로 앉아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오히려 이상하게 찾아오는 천재성을 질투하다 기어이 맞이하는 파국들(‘필멸’, ‘쿠문’)을, 숲을 지배하는 나무와의 황홀한 교접(‘나무 힘줄 피아노’)처럼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 김성중 소설이 주는 이 기묘한 도취는 아마도 유려한 리듬으로 짜놓은 이미지의 그물망 때문이겠지만, 정작은 전모를 다 털어놓아도 끝내 비밀로 남는 순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정의되지 않고 요약되지 않지만 충분히 매혹적인 눈으로 문장 바깥을 건너다보고 있다. 그 시선에 눈 맞추느라 우리는 낯선 장면들에 스며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책을 덮고 이야기 속을 떠다니던 빛들이 바닥에서 꺼지고 나면, 밤새 형광 날개로 하늘을 메우던 몽상들의 싸늘한 주검이 쭉 늘어서 있는 도시가 보인다.
그래서 문장을 벗어난 뒤에도 우리는 짱짱한 햇빛이 쏟아지는 ‘국경시장’에서 비틀거리는 자신을 읽고 있다. 좌절과 환멸의 미로들이 어제와 내일의 경계처럼 펼쳐진 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남은 가장 싱싱한 젊음을 잘라 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그 이문으로 새로운 욕망을 홍등처럼 달아놓지만, 말했듯이 자본이니, 본질이니, 구조니 하는 해석을 이 소설집 끝에 달아둘 필요는 없다. 다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기가 하루하루를 소진하며 살아가는 목숨들의 막다른 거처라면, 우리는 정말 김성중이 그려놓은 ‘국경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그의 명랑한 문장은 깊은 우울을 위해 쓰여졌다. 가장 화려한 조명이 죽은 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장례식장처럼 말이다.
신용목ㆍ시인
◆작가 약력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명지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소설집 ‘개그맨’(창비)을 펴냈다. 두 번째 소설집 ‘국경시장’(문학동네)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기억을 파는 ‘국경시장’을 포함, 욕망으로 점철된 인물들을 환상과 실재가 뒤섞인 세계 안에서 그려낸 여덟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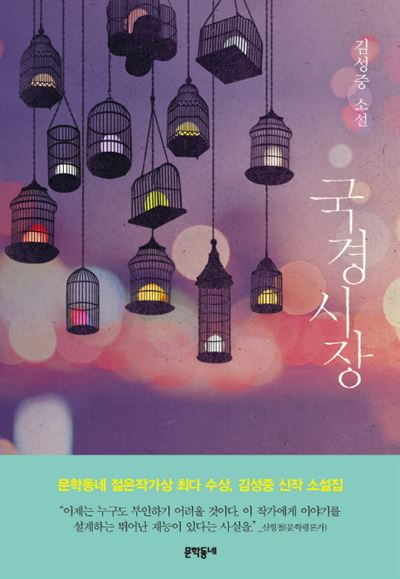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빛나는 거리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는 그저 술과 밤에 취한 어리석은 방랑객일까? 지구 한복판을 통과해 반대쪽으로 나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간신히 국경시장에서 탈출한 나는 망연히 주저앉아 도리어 지난밤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기억을 너무 많이 팔아버린 내게 그리워할 것이라고는 그곳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가?
―‘국경시장’ 중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