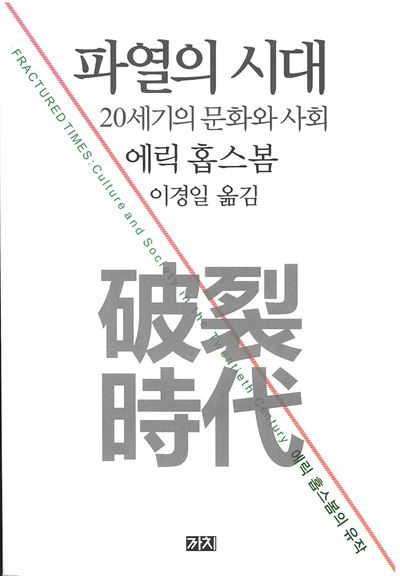
파열의 시대
에릭 홉스봄 지음ㆍ이경일 옮김
까치 발행ㆍ368면ㆍ2만원
2012년 타계한 위대한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유작이다. 세상을 떠난 해에 서문을 썼고 이듬해 책이 나왔다. 20세기의 문화와 사회를 부르주아 문화의 쇠퇴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 기고, 강연, 서평을 모았다.
이 책을 제대로 읽어 내려면 기본 지식과 교양이 필요하겠다. 20세기의 문화, 예술, 지성, 정치에서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낸 수많은 인물과 사건, 흐름을 가히 일망무제의 지평으로 펼치면서 역사가의 통찰로 섭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문명이 쇠퇴하는 시점으로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을 꼽는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흔히 고급문화로 불리는 부르주아 예술이 종전의 우월적 지위를 잃기 시작한 때다. 여기서 고급문화는 “공식적인, 인정된, 거의 배타적으로 유럽 모델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면서 “교육받은 소수”가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위신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극장, 권위 있는 갤러리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전시를 가리킨다.
홉스봅은 부르주아 문화는 소수 엘리트에 기반한 것인데, 20세기 후반 들어 교육받은 대중이 증가하고 대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예전의 아우라를 잃었다고 분석한다. ‘파열의 시대’라는 책 제목은 그렇게 기반이 무너지면서 깨지고 금이 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쇠퇴의 기점이 1914년이라면, 파열이 본격화하는 시기는 앤디 워홀 등의 팝아트가 부상하는 1950~60년대다. 기술시대의 무한복제 이미지가 예술로 승급하고, 예술이 예술만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류 속에 고급문화는 한정된 소수의 취향으로 쪼그라들었다.
홉스봄은 고급문화의 마지막 황금기로 1914년 이전의 10년을 돌아보고, 그 후의 쇠퇴와 대중문화의 부상,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는 고급문화의 대안과 전망을 이야기한다. 19세기 부르주아 문화의 형성에 유대인과 여성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히고 과학이 부르주아 문명에 미친 영향을 짚어낸다.

소수만 즐기는 고급문화를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거론한다. 그는 고급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훌륭한 유산은 보존되어야 한다”며 “고급문화의 운명을 시장논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클래식 음악축제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한 강연에서 주로 다뤘다. 바로 지금 생산된 작품은 관심 밖이고 고전 레퍼토리만 반복하는 고급음악, 대중과 상호작용하려 하지 않고 예술가들만 따로 노는 개념미술 등 불모의 문화 풍경을 비판하면서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다. 미래는 어떨 것이라고 예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의 몫이 아니다.
성격과 집필 시기가 서로 다른 글들을 묶은 책이라 긴밀한 통일성은 없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 예술과 정치를 치밀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대가의 시선은 충분히 날카롭고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예컨대 대량생산과 대중문화 시대에 전위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피력한 글은 미학 전문가의 진단 이상으로 깊이가 있다.
홉스봄의 대표작은 역사 4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다. 거인의 혜안이 빛나는 책들이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세계화, 민주주의, 테러리즘’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도 역작이다. 유작으로 나온 이번 책을 보면, 그의 빈 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진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