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중국 엄포 허투루 들어선 안돼
우리 정부, 확실한 방책 갖고 있는지 의문
우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집중해야

6ㆍ25전쟁 시기 전세 역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38선 돌파를 시도할 때 중국은 유엔 등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38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남침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우려해 필리핀에 있는 미 7함대를 이동시켜 대만해협 봉쇄에 나서자 중국은 패퇴한 국민당 군을 동원한 미국의 본토 침공을 걱정했다. 아는 바와 같이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은밀히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매복해 있던 수십만 중공군은 기습 작전으로 유엔군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여러 문헌을 보면 미국은 국공 내전을 겪은 중국의 전쟁 개입 엄포를 허풍으로 여기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전투과정에 중공군을 포로로 잡고도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회의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른바 확증편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판의 결과는 참혹한 1ㆍ4 후퇴로 나타났다.
국가를 세운 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내전의 상흔으로 피폐한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왜 참전을 결정했을까. 중국이 흔히 하는 말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중관계 때문이지만 그 속내는 지금의 중국 정부도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내 집 대문 앞에서 일어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리리 난(亂)이 일어나고 있는 이웃집에 들어가 불을 끄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다.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진 경우와 같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추진에 중국의 반응은 매우 예민하다. 공개적인 반대 의사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고사성어를 썼다. 초나라 항우의 사촌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게 한나라 유방(패공)을 죽이려는 뜻인 것처럼,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한국(항장)이 미국을 위해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야유로 보는 이도 있다. 도를 넘고 있는 중국의 관영언론 못지 않게 중화사상, 대국주의가 스며든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지금의 중국 정부 인식으로 보건대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조치가 그냥 하는 말이나 엄포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안보 위협으로 보겠다는 중국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수순이다. 중국식 사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점들을 들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대국의 체면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별 소용 없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비상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갖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 일각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 일단 부딪쳐보자는 객기는 무모하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후유증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사드 문제가 한중 양국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넘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파탄 국면이다. 군사 안보 이상으로 경제 안보도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한ㆍ중 양국의 영역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침체와 불투명한 금융의 파탄 위기 여부를 놓고 세계의 경제 호사가들과 투기꾼들이 동전던지기 확률게임을 벌이고, 세계 경제가 여기에 놀아나는 판에 이해 당사국들이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국제정치, 군사적 긴장까지 더해지고 있는 동북아 상황은 근래 보기 드문 위기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로부터 비롯된 여파가 관련 당사국의 과도한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다.
정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도 뒷짐만 지면서 북한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확실한 방책도 없이 다방면에서 모험주의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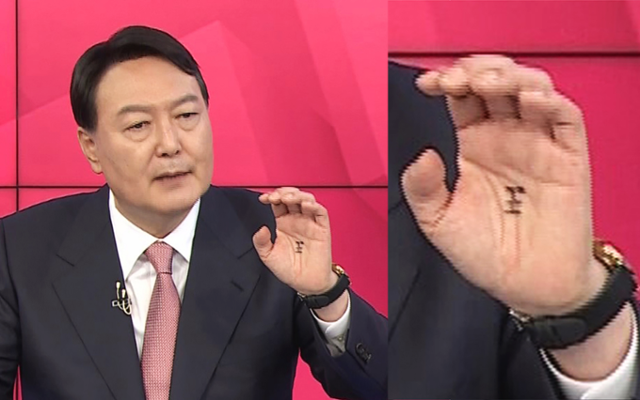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