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대 점원들을 앉게 할 수 없을까… 노동자에 공감하는 과학
고용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직원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고용주
“통증 원인은 장시간 기립 노동”
목청 높여 줄 과학자 필요해
보이지 않는 고통
캐런 메싱 지음ㆍ김인아 외 옮김
동녘 발행ㆍ296쪽ㆍ1만6,500원
마트 계산대에 선 직원을 누가 앉힐 수 있을까. 고용주는 할 수 없다. 손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님도 할 수 없다. 다른 손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 자신도 할 수 없다. 그가 투쟁을 결심한다면 앉는 것 보다 월급 인상이 우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마트, 백화점, 식당,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는 노동자를 앉힐 수 있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캐나다의 인간공학자 캐런 메싱은 저서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노동자를 앉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 과학자에 대해 말한다. 당신의 요통과 두통과 족부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 기립 노동 때문이라고 ‘주장’해줄 과학자 말이다. 그가 자신이 속한 업계를 손가락으로 콕 집어 지목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에 대한 과학계의 오랜 침묵 때문이다. 1976년 몬트리올 퀘백대 생물학과 교수로 일을 시작한 메싱은 우연히 방사선에 노출되는 제련공장 노동자 연구에 참여했다가 생의 일대 전환을 겪었다.
방사선이 인간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메싱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지만, 노동자들의 눈에 그는 ‘어쨌든 과학자’였다. 방사선 노출에 의해 유전자 변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손상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설명에 노동자들은 사색이 됐다. “그러면 내 딸의 건강 문제가 내 직업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 자리에 모인 노동자 6명 중 4명의 자녀가 구개열(선천적으로 입천장이 뚫려 코와 입이 통하는 질환)과 내반족(발바닥이 안쪽으로 굳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메싱은 유전학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노동조합과 일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실험실에서 곰팡이를 연구하던 메싱이 공장과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의 선 자세를 살피고 걸음 수를 계산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묻는 인간공학자가 된 것은, 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과학자들은 노동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흔히 떠올리는 ‘돈에 눈이 멀어 자본가를 위해 연구결과를 편집하는 못된 과학자’는 이 책에선 부가적인 내용이다. 그는 평범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노동자의 고통에 선뜻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학자들에게 요구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박에서 찾는다. 모든 학문적 연구는 ‘모른다’ 혹은 ‘확실치 않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은 태생적으로 목청을 높이기 힘든 분야다.
“과학에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괜찮은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여전히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 우리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로 관련성을 언급하는 과학자에게 혐오와 경멸을 느끼도록 배운다. 그런 과학자들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단순히 이것뿐일까. 메싱은 여성 건강에 대한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스타킹을 깜빡해 백화점에 들른 이야기를 한다. 가게에 있는 흑인 여성은 다른 모든 직원과 마찬가지로 서서 일하고 있었다. 카운터 뒤 남는 공간에 의자를 놓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직원은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자기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당신 상사도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상사는 제가 웃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건 학회에서 이 일화를 이야기했을 때 청중으로 온 보건학자들 대다수가 계산원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반응했다는 것이다. “계산대 점원이 앉아서 응대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메싱은 이를 ‘공감 격차’라고 부른다. 식당 주인의 관심사가 아름다운 그릇이라면, 종업원의 관심사는 그 그릇의 무게이며, 둘 사이엔 접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자가 노동자에 공감하지 못할 경우 그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진다. 10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공장 직원의 통증이 노화 때문인지,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인지, 혹은 서 있었기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당연히 과학의 질도 저하할 것이란 지적이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외치는 메싱의 말은, 오히려 중립이 극도로 희귀한 이 땅에선 다소 위험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언가가 비정치적이란 믿음은 언제고 깨진다. 누구도 영원히 실험실 안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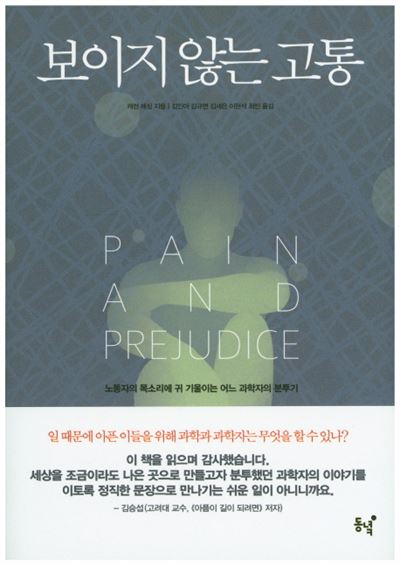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