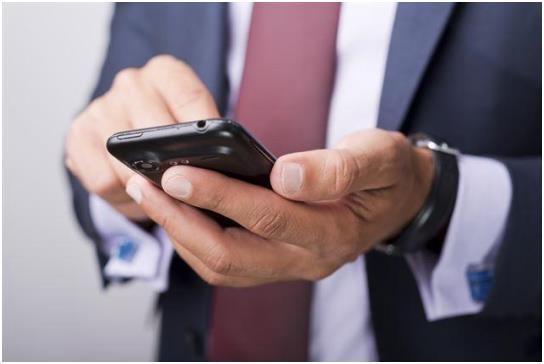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년 7개월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이후 통신서비스 가격 거품이 빠지고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시장 조사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요금제와 실제 사용량 사이엔 극심한 불균형이 존재했다. 실제로 2012년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통화, 문자,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요금제 기본 제공량의 60%에 불과했다. 기본 제공량 중 40%는 쓰지도 않은 셈이다. 같은 해 시민단체 YMCA도 월 5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80%는 한달 평균 데이터 1.1기가바이트(GB)만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이 사용량에 맞지 않는 높은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쏠리는 지원금이 문제라고 봤다. 최신 휴대폰 출고가에 육박하는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몰리자 ‘휴대폰 공짜’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을 시행하며 기본 원칙을 ‘차별적 지원금 금지’로 내세웠다. 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 적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였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2015년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으로 2014년(15만350원)보다 2,625원 줄었다.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 수준도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엔 4만5,155원까지 치솟았지만 2015년엔 3만8,695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대폭 감소, 월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2014년 7~9월 33.9%에서 지난해는 6.3%로 줄었다. 올 1~3월에는 3.5%까지 축소됐다. 이용자 차별과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다는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좀처럼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없잖다. 중저가 휴대폰 판매량 증가와 알뜰폰 시장 확대 등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란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 제한으로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된 이통사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3%, 7.4%, 5.2%씩 마케팅비를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아낀 마케팅비를 가격 경쟁력 강화에 투입, 사업자간 경쟁으로 추가 통신비 인하가 이어지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단통법의 순기능과 소비자의 체감도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