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보다 더 큰 것은 획일주의 폐해
손쉬운 ‘촛불 vs 태극기’프레임 벗고
현상 너머 맥락 짚어내려 노력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소리가 도처에 가득하다. 주말마다 경쟁하듯 벌어지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선 경찰차벽을 무너뜨릴 듯 격렬한 구호들이 난무하는 현장만 보면 한탄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국론 분열’이란 말 자체가 내게는 공허하게 들리고 몹시 불편하다.
분열(分裂). ①찢어져 나뉨. ‘갈라짐’으로 순화. ②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뉨.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다. 이어지는 물리ㆍ생물학 분야 용어풀이를 제외하면, 본래 하나였거나 하나여야 좋을 무언가를 전제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 말에 사자성어마냥 엮여 쓰이는 국론, 즉 국민의 여론은 본래 하나였거나 하나여야 마땅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서로의 이해(利害)와 생각의 다름 혹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파생된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목전의 갈등을 ‘국론 분열’로 치부한다면 지난 역사가 온통 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 77% 대 반대 18%(3일 한국갤럽 발표)로 찬성이 압도적이다. 근래 우리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절대다수가 한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국론의 분열보다는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획일주의가 낳은 폐해가 더 크고 잦았다. 지난 4년은 어떤가. 박근혜-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은 ‘100% 대한민국’이란 위험천만한 구호를 내걸고 뒤로는 제 편에의 유불리를 따져 국민-비(非)국민 나누기에 골몰했다. 그 배제와 억압에 동원된 수단이 특검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난 블랙리스트다. ‘갈라져 나뉨’은 광장 이전에 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렇다고 작금의 혼란상을 개의치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현상을 진단하는 잣대, 즉 ‘프레임’이다. ‘촛불 vs 태극기’란 겉핥기 식 프레임을 들이대서는 제대로 된 진단도, 바람직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기껏해야 국론 분열과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우려된다는 하잘것 없는 한탄만 쏟아내게 된다. 더 나아가 120여일 간 차디찬 광장에서 분노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아 촛불을 밝혔던 국민 다수와 ‘빨갱이’ 따위의 낡디 낡은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이들을 싸잡아 양비론을 설파하는 잘못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이 바라는 일이고, 주춤하던 친박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촛불 vs 태극기’ 프레임을 벗어야 ‘촛불은 선이고, 태극기는 악’이란 식의 오판도 피할 수 있다. 촛불 아래 모인 이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지닌 것이 아니듯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속내 역시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를 먼저 묻고 따져야 한다. 그래야 촛불에 대항한 상징적 행위로서 태극기를 들었지만 난데없이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고, 탄핵까지는 마땅치 않다고 여기면서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로소 보일 것이다. 태극기를 마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묻고 논쟁하고 끌어 안아야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
영화 ‘재심’의 모티프가 된 책 ‘지연된 정의’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돈 안 되는 재심 사건에만 매달려 온 박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박상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안전한 것은 누구나 해요. 위험한 일에 도전해야지! 변호사나 기자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지!” 그 역시 악몽에 시달렸지만 호기롭게 내뱉은 이 한마디 덕분에 결국 늦게나마 정의가 당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오늘도 광장엔 촛불이 타오르고 태극기가 휘날릴 것이다. 그 혼돈의 광장 한복판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국론 분열’은 없다. ‘촛불 vs 태극기’ 프레임에 더는 붙들리지 말자.
이희정 미디어전략실장 jaylee@hankookil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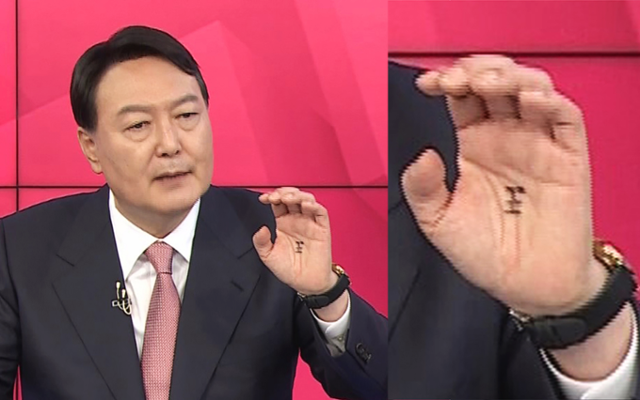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