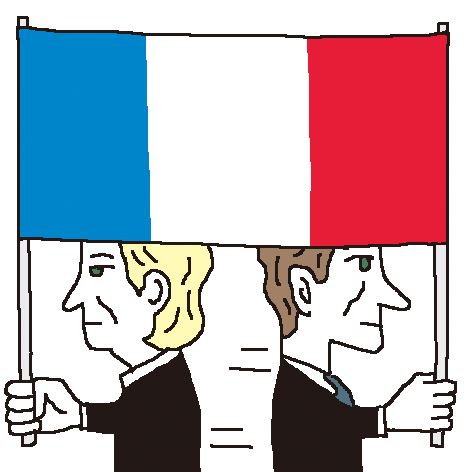
2차 대전의 굴욕에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지도자가 샤를 드골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 소련이 양분하던 세력판도를 재편하지 않고는 프랑스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고 미국보다 먼저 마오쩌둥의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프랑스판 비동맹외교’로 프랑스의 독립성ㆍ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드골주의’다. 강한 민족주의 색채로 비난도 받았지만, 드골주의는 제5공화국 이후 이어져 온 프랑스 공화국 정신의 뼈대다.
▦ 그가 미국과 소련에 맞설 수 있는 토대로 제시한 것이 통합된 유럽이다. 유럽경제공동체(EEC)ㆍ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킨 것은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해 독일의 재무장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유럽의 덩치를 키워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영국의 EEC 가입을 그가 한사코 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영국이 들어오면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영국을 통해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 공화당ㆍ사회당의 60년 양당체제를 무너뜨린 올 프랑스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부르짖는 공통의 구호가 있다. 드골주의의 계승이다. 결선투표까지 오르며 프랑스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도 ‘국민의 대통령’ ‘통합의 프랑스’를 외치며 드골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정반대다. 드골이 유럽공동체, 유럽단일통화로 프랑스 부흥을 꾀했다면 르펜은 EU와 유로존을 버려야만 프랑스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경 없는 EU가 난민 유입 통로가 되어 프랑스가 이민자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 르펜이 공약한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프랑스가 EU 탈퇴를 말한다는 건 유럽대륙의 입장에서 이중적 존재로 비쳐지는 영국의 브렉시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로베르 슈망, 장 모네로 이어지는 프랑스 통합지도자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하긴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칭송 받는 모네 조차 “지금의 EU는 개별국가 주권까지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지경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드골주의의 총아에서 프랑스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유럽통합의 운명이 역설적이다.
황유석 논설위원 aquariu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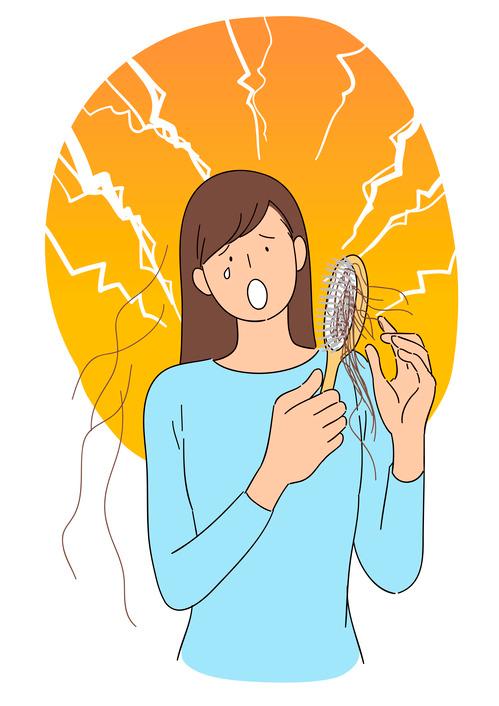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