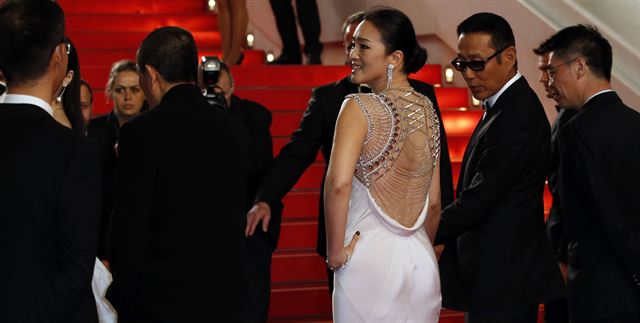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충무로는 경사를 맞은 분위기였다. 베니스국제영화제 등에서 인정 받은 대가의 뒤늦은 칸영화제 진출이었기에 수상에 대한 바람도 컸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칸영화제에서 처음으로 파티를 열어 세계 영화인들에게 ‘춘향뎐’의 우수성과 한국영화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
영진위는 2,0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한 호텔을 파티 장소로 확보했다. 곧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제시해 파티 장소를 채갔다. 영진위는 겨우 야외 천막을 얻어 불고기 파티로 승부를 걸었다. 지글거리며 익는 불고기 냄새로 외국인들의 코를 자극해 장소의 불리함을 만회하려 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파티가 정례화됐다. 최근엔 해변가의 운치 있는 천막 라운지를 빌려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열고 있다. 세계 영화인들과 국내 영화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영화를 알리는 이 하룻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6,000만원 남짓이다. ‘혈세’ 낭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정도는 약과다. 중국의 경우 하룻밤 파티에 8억원 가량을 쏟아 붓는다. 홍콩도 최근까지 8억 원 가량을 하루 파티를 위해 날렸다고 한다.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는 아예 대형 요트를 빌려 중국과 홍콩이 들인 돈으로는 꿈도 못 꿀 화려하기 그지없는 선상 파티를 연다. 예산이 없는 국가들은 영화제 기간 영화 판매 촉진을 위해 차려진 부스에 20명 가량씩을 초대해 1시간 가량의 조촐한 파티를 치른다. 칸영화제의 파티 풍경은 극과 극이다.
파티를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어느 파티는 어떤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다” “어떤 국가 파티는 주최자의 일장 연설이 길어 지겨웠다” 등등 칸영화제 손님들 사이에 파티 품평이 떠돈다. 파티 주최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나쁜 소문이 나돌면 다음해 파티에서 손님들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다.
돈 벌자고 돈 쓰는 참가국들
하룻밤 6000만원 파티 열자 한국영화 약진…중국은 8억원 써
매일 몇 개의 파티가 겹치는 칸영화제에서 파티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몇 년 전 대만은 중국이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자 서둘러 거금을 투여해 같은 장소를 잡아 파티를 개최했다고 한다. 무엇을 하든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대만의 절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당초 예정된 대만의 파티 장소가 중국측 장소보다 협소하고 비용이 싼 곳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였던 두 국가가 칸에서 한 차례 기 싸움을 펼친 것이다.
왜 각 국가의 영화기관이나 영화사들은 돈을 들여 파티를 열고 세계 영화인들을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걸까. 칸영화제라는 축제에서 각 국가 영화의 위세를 자랑하고자 하는, 단순한 과시용 행사일까. 인심 좋은 듯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퍼주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 다 돈 벌자고 돈을 쓰는 것이다.
파티는 교류의 장소다. 세계의 영화인들끼리 영화계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눈다. 파티를 통해 자국의 영화를 알리고 해외 영화를 알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 오냐가 결국 파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화려한 파티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귀빈을 초대하는 경향이 있다. 돈을 들인 소문난 파티에서 고급 정보와 많은 정보가 오갈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쓴 파티일수록 세계 영화인의 교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이나 자사 영화를 알리기도 제격이다. 칸영화제를 불야성으로 만드는 파티도 결국 돈 때문에 돈으로(때론 아이디어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하나의 전장인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영진위 파티(부산국제영화제측과 함께 진행한다)가 정례화 된 뒤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한국영화 최초 수상의 이정표를 세웠다. 2004년엔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2007년엔 전도연이 ‘밀양’으로 최우수여자배우상을 받는 등 수상 소식이 이어졌다.
파티가 물밑에서 은근히 여러 나라와 회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장소라면 필름 마켓은 대놓고 ‘쩐의 전쟁’을 펼치는 곳이다. 칸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필름 마켓은 세계 최대 규모 영화 시장 중 하나다. 가을 미국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필름 마켓과 함께 영화 시장에서 양대 산맥을 형성한다. 영화로 밥을 먹는 2만명 가량이 매년 이곳을 찾는다. 지난해에만 108개국 5,040개 회사가 이곳에서 영화를 사고 팔았다.
필름마켓에서의 성패도 '총알'이 좌우
한국 부스 하루 운영비만 1000만원…수입사들은 눈치 작전
필름 마켓에 참여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다. 1인당 적어도 280유로(약 42만원)를 내야 출입이 가능하다. 필름 마켓에 간이 사무실 격인 부스를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든다. 영진위 등 세계 각국의 영화기관들도 별도 부스를 마련한다. 15평 가량 넓이의 공간을 빌리는데 5,0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부스를 꾸미는 돈은 따로다. 영진위는 올해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부스를 마련했다. 필름 마켓이 10일 동안 열리니 하루 운영비만 1,000만원 꼴인 셈이다.
필름 마켓이 열리는 10일 동안은 돈을 총알로 쓰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실탄이 많다고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작전을 쓰냐도 중요하다. 때론 배짱으로 때론 으름장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수입사의 경우 경쟁사가 특정 영화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얼마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의 정보를 캔 뒤 유리한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한다. 물론 총알이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하다. 올해 국내 대기업 계열 한 영화사는 700만 달러의 실탄을 앞세워 흥행 가능성이 높은 한 미국영화의 수입 계약을 맺었다. 경쟁에 나섰다가 자금력에서 밀린 군소 영화수입사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쩐의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필름 마켓은 칸영화제의 주요 행사장인 팔레 드 페스티벌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차려진다. 건물 3층과 4층 등엔 4개의 극장과 영화제 사무실, 프레스 센터 등이 있다. 건물 상층부에서 턱시도와 정장을 입은 감독이나 배우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극장에 입장한 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는다면 건물 하층부에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매일 펼쳐진다 할 수 있다. 어느 국내 영화 수입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가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관념적인 상부구조가 형성된다고 마르크스가 말하지 않았나. 적어도 칸영화제의 건물과 영화제 구성 방식은 딱 그 모양이다.”
올해도 칸영화제가 막을 내리는 25일까지 누군가는 승자로 웃고 누군가는 패자로서 짐을 싸는 잔혹한 ‘쩐의 전쟁’이 펼쳐질 듯하다.
칸=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후기: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때 국내 영화 수입사들 사이에선 일본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화제였다. 국내 수입사들이 이 영화를 구매하려 몰리자 일본 영화사가 면접까지 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영화의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전형적인 예술영화 감독이었고 국내에선 흥행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3년 전 국내 개봉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 흥행 이변을 일으키며 상황은 돌변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수입사가 국내 상영권을 구입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지난 겨울 예술영화 시장의 ‘변호인’이라 할 흥행 성적(12만2,797명)을 올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