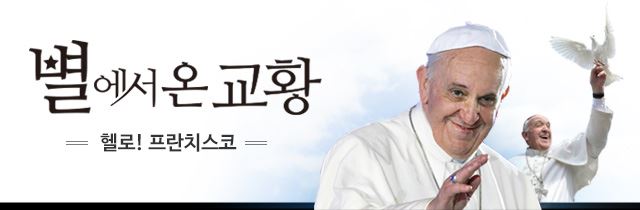
지난해 3월 13일 저녁, 최민호 신부(마재성지 성당)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있었다. 수만 군중과 함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뚫어져라 쳐다본 곳은 성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 모두들 새 교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뜻의 흰 연기가 피어 오른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8시쯤. 발코니로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이 나와 “하베무스 파팜(우리가 새 교황을 갖게 됐다)”이라고 외쳤다. “새 교황은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새 교황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최 신부는 당시 심경을 “두 번 놀랐다”는 말로 설명했다. 언론에 교황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베르골리오란 이름이 나와 놀랐고 프란치스코란 교황명에 또 한번 놀랐다는 것이다.
최 신부는 “즉위명은 교황이 사목의 푯대로 삼아 계승하고 싶은 성인의 이름 중 직접 선택한다”며 “예수회 소속인 새 교황이 예수회와 대립했던 프란치스코회를 만든 프란치스코 성인에서 즉위명을 따온 건 의외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역대 교황이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최 신부는 “이전 교황들은 대개 역대 교황들의 즉위명을 계승해왔다”며 “요한 바오로 2세는 요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이름을 합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을 이었고 베네딕토 16세는 유럽의 수호 성인이라 일컬어진 베네딕토 성인을 즉위명으로 한 역대 교황들의 뜻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요한은 교황명으로 스물세 번이나 쓰였다.
새 교황의 이름이 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에서 태어났다.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청빈과 겸손,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를 후세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로 기렸다.
최 신부는 “평생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도 가난하게 살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보니 예상 밖의 교황명을 택한 게 이해됐다”며 “교황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교황은 즉위 사흘 뒤인 지난해 3월 16일 기자들에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개표 도중 교황에 선출됐다는 걸 안 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생각났고 이어 평화의 상징인 성인 프란치스코가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과 같이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은 그래서 특별하다. 교황명이 곧 그의 정체성인 것이다. 독일 마인츠대학과 엘살바도르 중앙아메리카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 김근수씨는 책 ‘교황과 나’에서 이렇게 썼다. “예수회의 로욜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에서 영감을 얻으며 그를 모범으로 삼았다. 둘 다 교회를 개혁하려 애썼다. 두 수도회의 특성을 한 몸에 조화시킨 인물이 교황 프란치스코다. 그는 이름대로 살아갈 분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