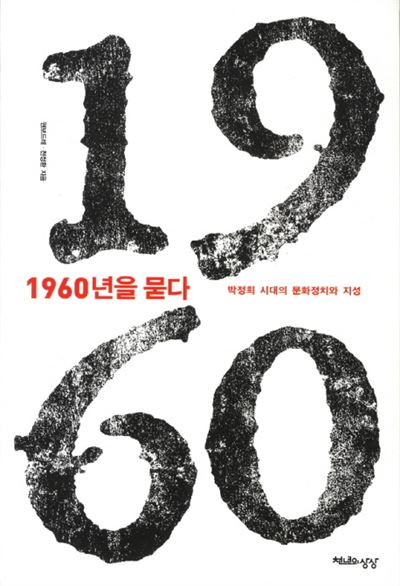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권보드래ㆍ천정환 지음
새로운 시대의 ‘전야’인가, 아직 더 짙은 어둠을 남겨놓은 ‘시대의 마지막 밤’인가. 이태 전 대선을 앞두고 정치평론가 박성민이 이문열의 소설 제목을 빌려 던진 물음이다. 그가 안타깝게 예견했듯이,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결과는 후자다.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지리멸렬로 점철된 지난 2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정치의 실종, 아니 몰락이었다. 한때 시대의 화두로 떠받들어지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결국 철학도 의지도 전략도 결여한 매표(買票)용 구호로 판명 났고, ‘유신독재의 부활’이라는 말이 정치적 수사(修辭)를 넘어 실체적 공포를 품은 채 회자된다. 길이도 깊이도 헤아리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다.
지난 대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의 망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망령이란 말을 망령되다 탓하며 전설 혹은 신화, 향수로 바꿔 불러도 달라질 건 없다. 대선 직전 발간된 ‘1960년을 묻다’는 그 망령을 낳고 키운 1960년대를 386세대 국문학자 권보드래ㆍ천정환이 문화연구를 통해 따로 또 같이 천착한 결과물이다. 저자들 역시 “죽었으나 끝내 살아서 산 사람들을 괴롭히는 망령”을 한탄하지만, 문화와 사회 각 분야 ‘창시자’를 낳은 “‘좋은 전설’로 살아 있는 1960년대”를 함께 반추한다. 그 망령에서 그만 벗어나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직접적인 기원”인 1960년대를 ‘전설’이자 ‘망령’으로서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4ㆍ19혁명의 속살과 5ㆍ16쿠데타의 태동 및 전개를 다룬 첫 장은 사뭇 도발적이다. 4ㆍ19가 시종 대학생에 의해 주도됐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라거나 4ㆍ19 직후의 혼란기에 지식인 사회에서도 ‘선의의 독재’라는 말이 횡행했고 ‘5ㆍ16은 4ㆍ19의 배반’이라는 인식이 공론화한 것은 1966년 이후였다는 등 대중에게는 낯선 사실(史實)과 해석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오늘날의 기원은 4ㆍ19 자체가 아니라 5ㆍ16이 돼 버린 4ㆍ19”라고 말한다. 자칫 4ㆍ19가 5ㆍ16을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오독될 수 있지만, 두 사건의 연속과 불연속을 제대로 살필 때 오늘날까지 이어진 ‘산업화 대 민주화’ 혹은 ‘자유 대 빵’이라는 이분법의 도식을 벗어나 비로소 통합을 모색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660여쪽에 이르는 책 두께나 낯선 학술용어들 탓에 술술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전설의 ‘사상계’나 당대 지식인사회의 자기모순, ‘인문고전 100선’ 따위의 기원이라 할 박정희 시대 ‘자유교양운동’ 같은 이야기들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자유와 방종의 이미지가 겹친 1950년대 여성상이 4월 혁명 이후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구호 속에 되레 퇴보했으나 그 와중에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과정을 다룬 대목도 흥미롭다. 기자가 그랬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 어렵다면, 관심 가는 주제부터 골라 읽어도 좋다. 다만 저자들의 마지막 당부는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시, 1960년이 필요하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