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리소설은 내가 세월을 낭비하는 가장 매혹적인 수단이다. 나는 시간을 잃기 위해, 잊기 위해 추리소설을 읽는다. 진지한 마니아라면 내 얘기가 못마땅할 것이다. 뭐, 어쩔 수 없다.
못되게 말해 나는 추리소설 마니아에 대한 편견이 있다. 막연한 불만과 비애감, 냉소로 치장한 은밀한 자기애 혹은 근거 없는 우월의식. 몰입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응징적 정의감으로 현실의 무력감을 달래고, 하드보일드의 거친 탐정들에게서 찰나의 위안을 얻는다. 그렇게 덧없이, 관념적으로 행복해진다. 음모가 걷히면 세상은 흑백의 대비로 선명해지리라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선택도, 삶도 단순해지리라는 기대. 믿음? 기대? 그건 과장이다.
남 말하듯 했지만 실은 내 이야기다. 그러니 저 편견은 위악의 고백이지만,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내 편견으론 위악도 중독의 한 원인이자 증상이다.)
그러니 이 블로그는 저급한 열정으로 추리소설을 탐닉해온 한 중독자가 행복하게 낭비해온(또, 하게 될) 하찮은 시간의 보잘것없는 기록이라 해두자. 솔직히 이건 일로 쓰는 거지만, 이 시간도 조금은 행복하고 소모적이길 바란다. 추리소설을 읽는 시간처럼.
나이팅게일의 비밀(Shroud for a Nightingale) P.D. 제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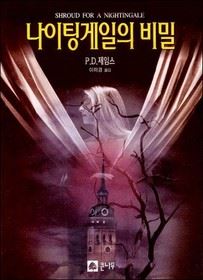
1971년 발표한 작가의 네 번째 소설. 그의 간판스타인 런던경시청 형사 아담 댈글리시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작품이다.
‘나이팅게일하우스’라는 한 병원 부설 간호사 양성학교 실습실에서 외부감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학생이 참혹하게 숨진다. 사고인가, 살인인가.
“병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기록된다. 맥박, 피 또는 혈장이 떨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초, 심장의 멈춤을 재는 분, 체온 강하와 수술 시간을 재는 시, 1월 28일과 29일 사이의 밤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었을 때 깨어있는 특정한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존 카펜더 병원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45쪽)
하지만 어떤 진실도 모두에게 흡족한 진실일 수 없고, 어떤 심판도 만악(萬惡)을 아우르진 못한다. 사소한 욕망이 어떻게 왜곡되고 증오와 음모로 전개되는지, 선의가 어떻게 굴절돼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 선의를 이용하는, 악에 대한 법의 정의는 또 얼마나 허술하고 미덥지 못한지를, 작가는 댈글리시의 추리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엉킨 실타래 풀 듯 풀어나간다.
제임스의 소설들은 고전적인 플롯에 충실하다. 그의 서사는 레고 블록처럼 차근차근 견고하게, 그래서 친절하게 조립된다. 배경과 인물- 사건과 정황- 근거와 맥락- 추리와 반전. 친절이 지나쳐, 자극적인 사건과 현란한 전개를 기대하는 독자라면 처음엔 좀 조급증이 일지 모른다. 대신 쫀쫀하고 톡톡한 글의 질감을 맛볼 수 있다. 공간 묘사나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의 표현들, 기품 있는 내러티브는 근래의 급히 쓰인듯한 소설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감칠맛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추리소설 주인공을, 추리의 주체가 아니라 서사의 속도를 좌우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좋은 탐정(형사)은 자신의 변속기로 서사의 속도를 장악한다. 제임스의 주인공 아담 댈글리시도 그 중 하나다. 그는 독자의 기대에 끌려가지도 앞질러가지도 않는다.
그 안정감으로 모호한 선악의 경계를 걸으며, 비록 끊임없이 회의(懷疑)하면서도 냉소에 투항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하드보일드 풍 탐정들이 비웃곤 하는 규정, 규율, 맹세의 미덕이 있다. 그는 모든 악은 근절돼야 하고 근절될 수 있다고 믿던 위대한 도덕의 시대, 질서정연한 세상의 신념을 놓지 못한다. 그의 속도, 그의 가치관에 동의하든 않든, 그는 존중 받을 만한 주인공이다.
“아무런 회의도 없을 정도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의가 들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괴롭히거나 조르지 않는, 지적이며 철학적인 회의들이었다. 젊은 시절 그것들로 잠 못 이루던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343쪽)
이 작품의 병원처럼 제임스는 ‘메이헴 파바(meyhem parva)’ 즉 미스터리의 작은 가상공간을 작품의 무대로 상정하곤 했다.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직 절판되지 않은 유일한 작품 <검은 탑>의 배경은 한 요양병원이다. (생계를 위해 런던의 한 병원(원무직)에서 만 20년을 근무한 제임스에게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만만했을 것이다.) <소망과 욕망>의 배경도 외딴 바닷가의 ‘닫힌’ 마을이다. 통제된 공간 안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용의자들과 벌이는 체스 게임. 그런 설정도 고전적이다. 그는 자신의 플롯과 에피소드, 등장인물의 습관 하나하나 등 모든 것을 장악하고자 했다.
나는 그의 소설들이 고집하는 고전적인 룰과 보수적인 가치들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때로는 설득 당함으로써 행복해지기도 한다.
지면에 연재하는 ‘가만한 당신’의 1월 24일자 주인공도 P.D 제임스다. 지난해 11월에 작고한 작가를 뒤늦게 소개한 까닭은, 그 즈음 숨진 이들 가운데 딱히 끌리는 이가 없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블로그를 그의 작품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였다. 그가 어떤 작가인지 미리 소개하고 싶었다.
▶ 기사보기
사실 내 첫사랑은 제임스와는 사뭇 다른, 대실 해밋과 레이먼드 챈들러다. 샘 스페이드와 필립 말로가 멋진 탐정의 준거라는 얘기다. 첫사랑은, 밉든 곱든 쉬이 잊히지 않는 법이니까. 그들에 비해 제임스의 댈글리시는 너무 모범적이다. 하지만 그는, 기사에 썼듯이, 200년 남짓 이어진 탐정ㆍ추리문학 계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가다. 나는 그를 황금기 탐정소설의 전통을 짊어진 마지막 세대이자 현대 추리소설의 첫 세대 작가라 여긴다.
기사에서 나는 그의 탐정인 런던경시청 형사 ‘아담 댈글리시’를 잘 아는 척 썼지만 실은 뻥이다. 번역된 그의 추리소설은 모두 4편이다. <나이팅게일의 비밀(1971)> <여탐정은 환영받지 못한다(1972)> <검은 탑(1975)> <소망과 욕망(1989)>. 저 가운데 <여탐정…>은 코델리아 그레이라는 여성 사립탐정이 주인공이다. 댈글리시는 작품 끄트머리에 엑스트라로 잠깐 등장한다. <소망과 욕망>에서도 댈글리시는 추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참관인에 가깝다. 런던경시청 형사인 그의 관할구역이 아닌 바닷가 마을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과 <소망과 욕망>은 품절된 지 오래라 도서관에 가야(그것도 서가가 아니라 서고에 들어가 있다) 읽을 수 있다. 그러니 제임스가 숨진 뒤 일부 국내 신문의 부고기사들이 그의 대표작을 <여탐정…>이라 소개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몇 독자가 메일로 내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여탐정...>은 민음사에서 <여자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란 제목으로 먼저 나왔고, <피부 밑의 두개골> <죽음의 맛>도 1991년 일신서적의 '일신추리문고'로 출간된 적이 있다. 물론 모두 절판됐고, 도서관 사이트에서도 나는 못 찾았다. 독자는 책이 옛 문고판으로 볼품없이 만들어져 "도서관에 안 들어갔을 확률이 크다"고 친절히 전해주셨다.
책도 사람처럼 '외모'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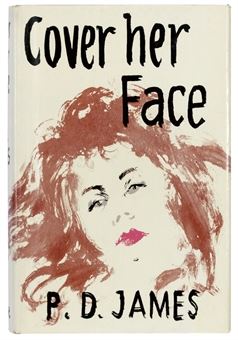
우리에겐 코넌 도일과 아가사 크리스티의 전집이 있다. 장르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작가의 데뷔작도 해외 시장에서 주목 받는다 싶으면 금세 번역 출간되곤 한다. 우길 마음은 없지만, 개중에는(두 전집 중에도) 되다만 작품도 적지 않다.
출판사 편집장이 원고를 읽자마자 그를 식사에 초대해 나오게 됐다는 데뷔작 <Cover Her Face>도 읽고 싶고, 줄리언 시먼스가 “(그의) 가장 자신만만하고 완성된” 작품이라 평한 <A Taste of Death>도 읽고 싶다.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문단과 독자들이 압권으로 꼽는다는 <Innocent Blood> 도 있다. <Cover Her Face>는 저작권 소멸시효도 지났다.
부당하게 홀대 당한다 여겨지는 것들을 편파적으로 편드는 것도 어쩌면 옹졸함이다. 그것도 마니아들의 ‘관념적 정의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