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버트 데이비스(1909~1949)의 ‘탐정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임재서 옮김, 북스피어)를 읽은 게 한 달 남짓 전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극찬한 작품이란 말을 먼저 풍문으로 들었고, “이제까지 쓰인 가장 웃긴 탐정소설”이라는 한 비평가의 평가도 기사로 읽은 터였다. 결론적으로 내게, ‘탐정은…’의 최대 미스터리는 어떤 점이 그(들)을 매료시켰을까 하는 점이었다.

사립탐정 도앤과 그의 파트너 카스테어스(그레이트 데인 종의 대형견)가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 펼치는 추리(라기보다는 모험담에 가깝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지진이 나서 모두가 고립된다든지 하는, 대놓고 억지스러운 설정이 코믹하달 수는 있겠다. 옮긴이의 말처럼 하드보일드 문체의 한 전범이라는 점이 까다로운 철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를 매료시켰을 수 있다. 멋진 외모와 나름의 정의감으로 무장한 탐정들의 세계에서 도앤이 지닌 개성이, 작품이 발표된 당시(1943년 원제는 ‘The Mouse in the Mountain’)로선 자못 이채로웠을 것이다. “땅딸막하니 다소 통통한 편이었고 오동통한 얼굴은 불그레했으며 아기처럼 순진무구한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데가 있었다. 무척 선량하고 쾌활한 사내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는 살인도 예사로 여기는 거친 인물이다. 게다가 개가 파트너라니. 그런 심오한(?) 의뭉스러움이 데이비스의 작품과 도앤의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내게 가장 웃긴 탐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영국 작가 조이스 포터(Joyce porter, 1924~1990 )의 ‘윌프레드 도버 경감’을 꼽겠다. 그는 한 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경찰이다.


자살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 갈 길이 바쁘다고 외면하려고 들고, 힘들고 성가신 일은 부하 형사 ‘매글레거’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물론 공(功)은, 있을 때도 별로 없긴 하지만, 대개 그의 차지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법은 없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고, 공짜 밥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때 되면 차도 얻어마셔야 한다.
“이봐, 잠깐만.” 도버가 말했다.
“그 담배는 두고 가 주게. 내 것은 이제 동이 난 모양이니.”
매글레거는 도버의 나쁜 버릇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에서 많이 팔고 있잖습니까!”
매글레거는 건방진 대답을 했다.
도버는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 거기서 팔고 있던가? 그럼, 나가기 전에 두 갑만 사다 주게. 나는 자네가 피우는 것처럼 필터가 달린 것은 마음에 안 드네”하고 말했다.
매글레거는 좀 반항한 덕분에 10실링 2펜스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도버 4/ 절단’(황종호 옮김, 동서문화사) 156쪽.
부하에겐 철야 감시업무를 맡겨놓고 자신은 어지간해서는 호텔 방을 안 나선다. 심술도 장난이 아니고 수틀리면 욕도 서슴지 않고 퍼붓는다. 외모? 188센티미티의 키에 110kg의 거구로 “단추 구멍 같은 눈과 경단 같은 코와 지저분한 입이 자리잡고 있으며, 코 아래에는 아돌프 히틀러 이래로 완전히 인기가 없어져 버린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위 책, 옮긴이의 말에서)
범죄 수사 실력은? 그건 알 수 없다. 작품 속에서 알려진 바 그는 썩 실력 있는 형사는 아니다. 런던경시청의 누구보다 범죄를 증오하지만 그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기 싫어서다. 물론 사건을 맡으면 나름 추리도 하고 더러 그럴싸한 추리를 내놓기도 하지만 작중에서 그의 추리가 적중하는 예는 드물다. 하지만 독자로선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는 제대로 짚었지만, 세상이 그를 속이고 있는 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읽어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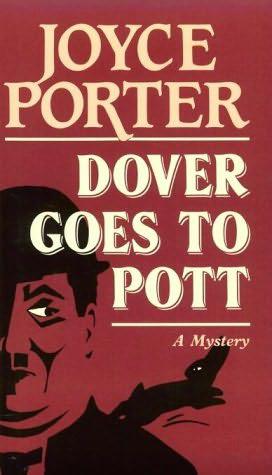
여성 작가 조이스 포터는 11권의 도버 시리즈를 썼고, 에디 브라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시큰둥한 스파이’(Eddie Brown, The World’s Most Reluctant Spy)시리즈를 네 편 썼다고 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건, 내가 아는 한 ‘도버 4/절단’이 유일하다.
아내와 휴가 여행을 떠나던 중 월라튼의 캐리곶에서 자살 사건을 목격하고, 시민의식에 투철한 아내 ‘탓’에 어이없게도 사건을 맡게 된 도버 경감. 자살자는 관할 경찰서 형사이자 서장의 덜떨어진 조카로 밝혀진다. 자살의 배경을 밝히는 와중에 이어지는 살인과 음모가 ‘도버 4’의 줄거리다.
몇 대목만 인용하자.
(사건 관련자를 인터뷰한 뒤 식당에서)
“어떻습니까, 경감님?”
“응?” 도버는 메뉴에서 눈을 들었다. “글쎄, 나는 스테이크와 키드니 푸딩으로 하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메글레거는 화가 치미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 도버는 그렇게 말하더니 또 메뉴로 눈을 돌렸다. “포토퓨가 뭔가?”
“비프 스튜입니다.”
“흥, 그러면 그렇게 쓸 것이지.”
도버는 아주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149쪽)
(공을 독점하기 위해 부하가 얻어온 정보는 몽땅 보고받으면서 자신의 성과는 일체 알려주는 법이 없는 도버 경감의 면모를 엿보게 하는 대목.)
매글레거는 선 채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도버의 흉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도버가 그처럼 짐작이 안 간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뭔가 조사법이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늘 그러했다. 매글레거는 지금까지의 사건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경찰의 결정에는 뻔뻔스러운 자도 얼굴을 붉히는 그런 면이 있다. 물론 도버가 그 당사자다. 도버가 귀찮은 존재를 떨어버릴 때의 말은 으레껏 이러했다.
“자네에겐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늙다리 술꾼이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가려보는 일이다. 매글레거는 과연 어느 쪽인가 하고 도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정말 얼빠진 늙은 너구리이다. 그런데 도버 쪽은 어떤가 하면 그 흐리터분한 머리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일은 결코 없었다. 특히 일과 관계되는 문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막연하다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151쪽)
하지만 ‘얼빠진 너구리’ 같은 ‘늙다리 술꾼’ 도버 경감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저항하기 힘든 그 매력의 비밀이 조이스 포터 소설의 최대 미스터리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