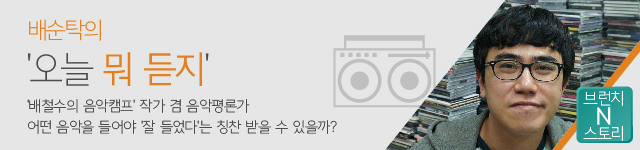
이 세상엔 으레 빤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포스를 주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관심이 가는 이성과 함께 로맨틱 코미디류의 영화를 한편쯤은 봐줘야 한다든가, 몇 번 정도 평범한 식사를 했으면 왠지 다음 차례에는 이른바 ‘핫 스팟’에 위치한 예약 필수 레스토랑에서 여친이 된 그녀에게 근사한 디너를 대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알다가도 모를 느낌 말이다.
가을은 음악 듣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것도 그렇다. 아니, 그럼 다른 계절에는 음악 듣기가 영 시원찮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가을에는 왠지 괜찮은 음악 몇 곡 좀 들어줘야만 할 것 같으니, 이 기분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을은 매혹적이다. 무엇보다 ‘사색과 산책’에 모두 적합한 계절은 아마도 가을 외에는 없지 않을까. “아니야. 봄이 있잖아!”라고 항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대답을 던지련다. “황사 때문에 탈락!” 드디어 계절에도 서바이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바람이 분다. 어제 새벽에는 좀 추워서 여름 내내 열어놓았던 창문을 처음으로 반쯤 닫고 잤다. 그러고 보니, 절기상 입추와 말복도 이미 지나갔다. 낮에는 아직까지 덥지만, 밤늦게 창문을 열어보니 가을이 조금은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1시. 저녁에 비가 내려서일까. 시원한 바람이 괜히 기분을 들뜨게 하는 것도 같다. 창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고, 사방은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톤을 좀 가볍게 가보자는 취지에서 요즘 같은 밤에 듣기 딱 좋은 음악들을 세 곡만 꼽아봤다. 아직 낮에는 더우니까 꼭 ‘밤에 혼자서’ 감상하기를 바란다.
Fields Of Gold / Sting (1993)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팝송이다. ‘(황금빛) 보리밭 너머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은 나를 기억하시려나요.’로 시작되는 첫 구절만 딱 들어봐도 이건 영락없는 ‘가을 노래’다.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가 극찬을 했다는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틀고 금빛으로 빛나는 들판을 가로지르며 운전 한번 해보는 것이 내 오랜 로망. 그런데 아직까지 해볼 기회가 없었다. 참고로 이 원곡보다 여가수 에바 캐시디(Eva Cassidy)가 부른 리메이크를 더 선호하는 팬들도 많으니 함께 들어보시길. 스팅의 것이 우아하다면, 에바 캐시디의 것은 보다 강렬하다.
Sunny Came Home / Shawn Colvin (1997)
미국 출신의 여성 싱어 송라이터 숀 콜빈(Shawn Colvin)이 1997년 발표한 곡. 이 곡에서의 ‘Sunny’는 곡 중 주인공의 이름인데,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도망친 사연을 지니고 있다. 이런 슬픈 스토리 때문일까. 이 노래는 무조건 저녁 무렵의 낙조와 함께 들어야 제 맛이다. 절대 걷지 말고 자동차 안이나 운동장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감상하면, 그 감동이 배가될 것임을 약속하는 바다. 6시부터 8시라는 시간대 때문일까.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도 요즘 같은 때에 유독 자주 신청 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바람이 분다 / 이소라 (2004)
이소라가 ’바람이 분다‘를 처음 발표한 2004년, ‘결국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포함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을 무수한 청춘들을 생각해봤다. 그들도 나처럼 이 아픈 곡을 들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했을 테지.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픔을 아픔으로 치유하는 것.’ 단순하게 낭만적인 음악이었다면 섣부른 낙관주의를 미끼로 유혹했을 것이다. “곧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소라는 거짓 위로하지 않는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고 내면의 격랑을, 그 엇갈림과 사무침을, 자신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진실을 고통스럽게 토해낸다. 이 와중에 장밋빛 미래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괴로운 현재만이 도돌이표처럼 중첩되어 쌓여갈 뿐이다. 그야말로 이별인 것이다. 이렇듯 자전하는 슬픔 속에서 이소라는 이별과의 전면전(全面戰)을 불사한다. 올해 가을에도, 누군가는 이별로 인해 아파할 테고, 이 곡을 듣고 있을 테지. 그(녀)가 펼칠 그 전면전에, 이 음악으로 자그마한 진짜 위로 하나 부쳐본다. 그나저나 “‘바람이 분다’는 너무 평범한 선곡 아닙니까.”라며 불만을 표시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그래서 내가 글의 도입부에서 말하지 않았나. 이 세상엔 으레 빤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기분을 남기는 것들이 있다고.
음악평론가·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배순탁 '오늘 뭐 듣지'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