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패션이다. 더 이상 탈 것, 여가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스타일과 개성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면서 자전거를 타는 연령층도 다양해졌고 자전거 종류도 많아졌다. 요즘 자전거족들은 어떤 자전거를 즐겨 탈까. 내게 맞는 자전거는 무엇일까… 궁금한 것이 많아질수록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일이 느는 것은 당연지사. 검색포털 네이버의 데이터랩으로 검색어 빈도수를 뽑아 시기별 ‘대세 자전거’를 정리해 봤다.

1. 2010년 이전 - 유사 MTB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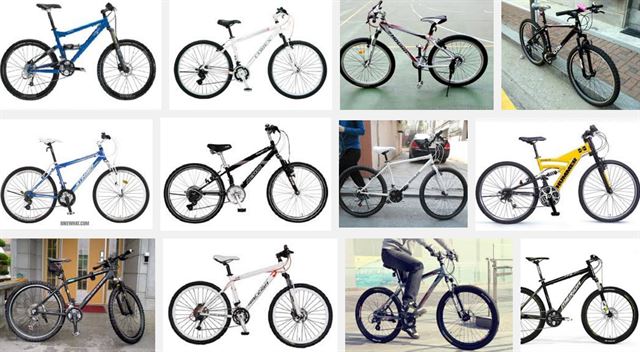
5~6년 전만 해도 자전거는 모양만 산악자전거(MTB)인 ‘유사 MTB’가 대세였다. 일부 신문의 정기구독 사은품이나 각종 행사의 경품으로 제공되는 자전거가 바로 이 형태다.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고강도 소재를 프레임에 사용한 MTB는 거친 산악 구간에서 큰 충격을 버틸 수 있다. 반면 낮은 등급의 부품과 소재로 제작하는 ‘유사 MTB’는 비포장길을 천천히 달릴 수 있는 정도다. 드문 일이겠지만 이런 류의 자전거로 산을 탔다가는 충격을 버티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평지에서는 두꺼운 바퀴와 무게 탓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산악과 평지 어느 곳에서도 단점뿐인 형태다.
2. 2011년 이후 - 하이브리드 자전거, 시티 바이크의 유행

MTB와 로드자전거의 특징을 섞은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2012년 4대강 자전거도로 개통 이후 자전거 붐을 이끌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MTB(또는 유사 MTB)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바퀴가 얇아 평지에서 MTB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조작이 비교적 쉬워 입문자들이 많이 찾는다. 또 MTB나 로드에 비해 가격대가 낮아 1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꾸준히 찾고 있다.
3. 2014년 이후 - 대세는 로드

로드가 말 그대로 대세다. 사이클이라고 알려진 로드 바이크는 자전거 종류 중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검색어 빈도수를 기록했다. 속도가 빠르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로드는 일반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다.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늘었다. 안전 운행, 이동 코스, 올바른 자전거 문화 조성 등 관련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하고 있는 동호인들도 로드 붐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수입업체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로드 자전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로드가 대세임을 보여 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양만 로드인 자전거에서부터 중형차 가격을 뛰어넘는 한정판까지 출시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로드 인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 2015년 - ‘간지왕’ 픽시

2015년에는 ‘자전거에 구현된 미니멀리즘’ 픽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픽스드 기어(fixed gear) 자전거의 다른 이름인 픽시는 단순한 구조와 독특한 구동방식으로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픽시는 기어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페달을 돌리는 크랭크와 뒷바퀴가 체인으로 고정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게 되는 독특한 방식의 자전거다(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앞으로 굴릴 때만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
앞으로 구르면 앞으로, 뒤로 구르면 뒤로 움직이는 원시적인 운동원리가 적용된다.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게 된다. 이런 구동원리를 이유로 상당수 픽시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는다. 페달을 멈춤으로써 자전거의 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고 픽시를 타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픽시 이용자 사이에서는 브레이크 장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 미니벨로

바퀴 지름이 20인치 이하인 자전거를 일컫는다. 대세였던 적은 없다. 스트라이다, 브롬튼 등 브랜드가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마니아 수준에서 머물렀다. 접히는 형태의 미니벨로는 대중교통 적재가 가능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출퇴근이나 통학시간 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서브 자전거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엔 타는 이의 실력과 의지를 오롯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공평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탈 것’이 얼마나 될까. 자전거 위에서만큼 내 노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서로 다른 자전거를 타더라도 똑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먼저라고.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