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현재의 당뇨병 진단 기준은 5.9%가 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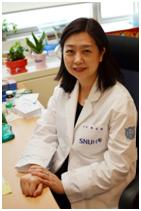
현재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당뇨병학회 등 세계적으로 당화혈색소6.5% 이상인 경우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뇨병 미세혈관합병증을 기준으로 이 수치보다 아래인 경우도 당뇨병에서 안전하지 않다.
당화혈색소는 환자의 혈액 속 적혈구에 붙어 있는 포도당(혈당) 농도를 보는 수치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수치라 공복 혈당 수치에 비해 신용도가 우수한 검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가 5.6%만 넘어도 향후 당뇨병이 더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당화혈색소가 5.7% 이상인 경우 미래의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남한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최성희(사진)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한국인유전체역학사업조사’의 하나로 6년 동안 경기 안성시(5,018명)와 안산시(5,020명)에 거주하는 1만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기반 코호트(cohort) 사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당화혈색소 5.6%를 나타낸 사람들은 6년 뒤 당뇨병 민감도(sensitivity)가 0.594, 특이도(specificity)가 0.769로 나타나 당뇨병 초기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데 최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 5.6% 이상이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남성은 2.4배, 여성이 3.1배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당뇨병학회의 저명한 연구지인 ‘Diabetes Care’에 실렸다.
최 교수는 “당뇨병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뇨병에 근접한 ‘그레이 존(grey zone)’인 당화혈색소 5.6~6.5% 수준이라면 현재 당뇨병일 가능성과 향후 당뇨병을 앓을 수 있는 만큼 운동ㆍ식이요법을 병행하고, 가족력, 비만도, 동반질환 등을 고려해 조기에 당뇨병 정밀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뇨병 예방 연구(Diabetes Prevention Study)’ 등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인 당화혈색소 5.6~6.5%인 사람이 꾸준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행하면 30% 이상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또한 “이번 연구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당화혈색소 5.9% 이상이면 현재 상태에서 이미 당뇨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따라서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5.9% 이상이라면 당뇨병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화혈색소를 이용한 당뇨병 진단은 공복혈당을 통한 진단보다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 일치도가 더 높아 진단 유용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당뇨병학회는 3년마다 공복혈당 측정이나 경구 포도당 부하시험을 이용해 당뇨병 발병 가능성 여부를 검사하는데 경구 포도당 부하시험은 쉽지 않고 공복혈당 측정만으로 당뇨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지 여전히 논란거리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