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소중함에 대해 뭔가 그럴듯한 말을 찾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될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유명해진 ‘공론장’ 개념이다. 매우 거칠게 요약하자면, 공공의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대등하게 참여하여 합리적 이성으로 토론을 나누는 어떤 영역을 나타낸다. 엉터리 다수결을 민주주의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시민적 합의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려면, 튼튼한 공론장이 필수적이다.
공론장을 구현해내야 할 구체적인 플랫폼으로 자주 꼽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언론이 공론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사가 바로 공론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시민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공공 사안에 대해 조롱 대잔치가 아닌 건설적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어로 대충 쓰일 때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론적 의미는 서로 다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상어의 보편적 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공론으로서도 발전시키려면, 그 간극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예로 들어보자. 일상어에서 혐오란 뭔가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정도로 쓰인다. 하지만 공론적 의미에서는, 대등한 동료 시민으로 공존해야 할 상대에게 혐오감정을 바탕으로 구체적 위협을 하거나 제도적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혐오 표현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되, 불평등한 현실의 권력관계를 감안하여 각 주체에 대한 관용 수준은 달리 하도록 디테일을 토론해야 한다.
혹은 ‘표현의 자유’도 그렇다. 일상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통쾌한 말들을 뭐든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적 의미에서는 사회 제도로서 자유로운 비판을 보호하는 것과 혐오조장 방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적 규범으로서의 규제를 구분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풀어야 할 조율의 기준을 저울질해야 한다. ‘정치’는 또 어떤가. 일상어에서는 권력자들의 권력놀음 따위를 지칭하곤 한다. 하지만 공론적 의미에서는 거래와 합의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적 절차다.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조차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주제 사회의 기본 전제 위에서 세부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상어와 공론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기, 그것이 바로 언론이 공론장이 되는 길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대화를 공론적 의미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적극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개념 정리는 기본이고, 사안에 대해 집요하게 정제된 해설을 첨부하고 기사들을 서로 연결하며 맥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공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최고위 공무원이 진실한 사람들, 창조경제 같은 공허한 개념들을 막 던져도 인구 과반이 용납해주는 현실 앞에서는 좀 허망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미디어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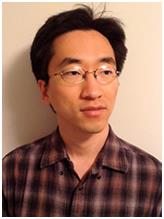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