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래된 냉장고가 있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사촌 동생 정도 된다. 서비스 라벨에 ‘93년’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 이 녀석이 견뎌 온 세월이 얼마나 두터운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가지 불만이 있다면 큰 소리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야심한 시간에 특히 심하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온 집이 떠나가라 ‘우웅’ 울어대는 통에 신경이 곤두설 정도다. 그러나 소리를 내는 울음통을 갖게 된 것은 이 녀석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전기 냉장고 vs 가스 냉장고의 전쟁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냉장고 경쟁이 한판 벌어졌다. 당시에도 대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중소기업 세르벨이 냉장고로 실력 다툼을 벌였다. GE는 전기로 동작하는 냉장고를 보급하려 했다. 이에 맞서 세르벨은 가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를 개발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GE의 냉장고는 지금의 냉장고와 비슷했다. 전기를 공급받아 전동기가 돌아가면, 프레온 가스가 순환하며 액화와 기화를 반복해 냉장고 안의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프레온 가스를 압축하는 과정을 가리켜 압축식 냉장고라고도 부른다. 압축식 냉장고에는 압축기와 모터, 몇 개의 팬이 필요한데 소음은 바로 이 부품 때문에 발생한다. 심하면 진동이 생기는 일도 많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는 원인 중 하나다.
세르벨의 가스식 냉장고는 흡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스를 이용해 불꽃을 점화하고, 불꽃이 냉매를 가열하면 가열된 냉매의 기체가 물에 용해돼 냉장고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압축기나 전동기, 팬과 같은 부품이 필요 없었으므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품이 고장 날 일도 별로 없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동작 원리만 보면 당시 냉장고 경쟁에서 가스식이 전기식과 한 판 붙어볼 만 했다. 당시 미국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집보다 가스를 쓸 수 있는 가정이 더 많았다고 하니 가스식 냉장고가 왜 시장에서 패배하게 됐는지 의아할 정도다. 하지만 냉장고 경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의 힘이었다.
당시 GE는 미국에서 발전소를 짓는 등 가정에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GE 외에도 웨스팅하우스 등 전기 사업을 벌이는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기냉장고에 달려들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까지 동원해 미국 전역에 홍보를 하기도 했단다. 당시 세르벨의 자본금 전체보다 많은 비용이 홍보비로 지출됐다. GE를 중심으로 한 전기냉장고의 시장 장악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던 셈이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 가정에서는 전기냉장고가 가스식 냉장고보다 더 일반적인 물건이 됐다. 오늘 밤도 시끄럽게 울어대는 저 모자란 녀석의 우렁찬 ‘성대’도 GE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전기냉장고 대신 가스식 냉장고가 널리 보급됐다면 어땠을까. 냉장고 소음에 뒤척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끄러운 냉장고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이 결코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냉장고를 쓰는 모든 이들에게 다소 억울한 일이다.
세상엔 기술의 우열과 관계없이 표준이 정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원인, 정치적인 이슈… 이밖에 기술을 둘러싼 복잡 다단한 일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어떤 것은 선택 받고, 다른 것은 배제된다. 우월한 기술이 곧 인류에 도움이 되므로 선택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은 냉장고 사례 앞에 힘을 잃는다. 기술은 생각보다 힘이 없고, 누군가의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 사용자의 기술 선택권 고려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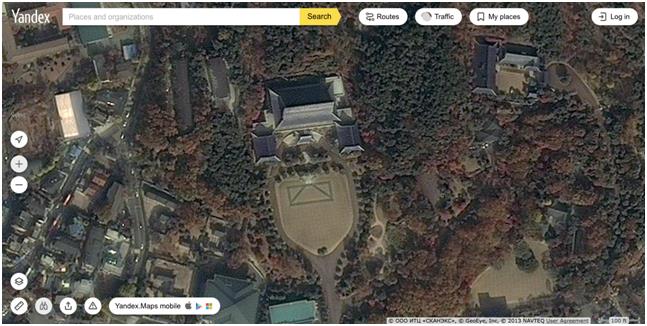
지난 8월24일, 우리 정부는 또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결론 내지 못했다. 구글에 지도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협의체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누군가의 반대로 구글은 앞으로 최대 두 달여를 더 기다려야 한다. 서비스 주체인 구글에 가장 아쉬운 일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일은 우리에게 더 큰 손해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구글 지도의 보편성과 편리함, 저비용성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책임지는 이들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불편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공위성 사진이 수많은 사이트에 공개돼 있고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돼 존재하는 오늘날, 지도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인터넷도, 인터넷용 지도도 없어 해외에 종이 지도를 갖고 나가는 것이 실제로 안보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는 60년대 만든 낡은 법안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단순히 구글에 지도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낡은 법의 허점을 알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논의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세금 문제는 점입가경이다. 구글이 만약 지도 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한다고 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불확실하다. 본사의 예비적 성격을 갖는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약 때문이다.
더불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는 지도 반출 이슈와 관련이 없는 얘기 아닌가. OECD가 초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제법과 공조한 국내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전혀 맥락이 다른 사안인 지도를 볼모로 삼아 국내에 서버를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철 지난 안보 이데올로기, 논지와 어긋난 세금 여론의 총력전 속에서 사용자의 기술 선택권은 끼어들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 디지털의 역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 줄다리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소음을 갖게 된 냉장고처럼, 전 세계 보편화한 서비스의 진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태계 확산이 저지된 것은 사용자의 의지가 아니다.
오늘따라 냉장고가 더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일 것이다.
오원석 IT칼럼니스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