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작업이 처음 시도됐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문화 현상 분석은 그 동안 다방면에서 있었지만, 현대미술의 경우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데다 분석 결과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쳐 시도된 적이 없었다.
미술전문매체 월간 ‘퍼블릭아트’는 창간 11주년 기념으로 ‘다음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현대미술에 대입”해 보고 그 결과물을 10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했다. 논의는 “현대미술이라는 복잡다단한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대중의 시선은 어떤 형태인지 알아볼 필요성”만은 분명하다는 데서 시작됐다. 빅데이터로 예술의 가까운 미래를 읽을 수 있을까? 예술이 빅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쪽으로 기운 듯 하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우선 현대미술을 설명하는 16개의 대표 키워드를 선별했다. 현대미술, 공공미술,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단색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레지던시, 비엔날레, 작가, 미술평론, 도슨트, 큐레이터 등이다. 그 다음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기사, 블로그, 트위터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분석했다.

‘현대미술’에 대한 최근 6개월 간 대중의 반응은 41.7%가 부정적이었다. ‘기분 나쁘다’ ‘어렵다’ ‘형식적’ 등이 주를 이뤘다. 9년 전만해도 ‘경이로운’ ‘독창적’ 등의 단어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긍정적 반응(40.9%)이 부정적 반응(14.8%)을 압도했다. “그새 예쁨보다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콘텐츠의 성격보다 확산 그 자체에 방점”을 두는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반영된 탓도 있다. 부정적 반응이 많아진 데는 “온라인상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시와 작품들이 대중친화적임을 표방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연 그간의 외침이 그저 공허한 울림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고무적인 결과도 보인다. ‘현대미술’을 탐색어로 넣었을 때 과거에는 ‘뉴욕’ ‘파리’ ‘런던’ 등이 연관검색어로 도출됐던 반면, 현재는 ‘작품’ ‘관객’ 등이 주로 등장했다. ‘미술관’을 넣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대중의 관심이 미술 그 자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카페’가 주요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술관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됐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미술이 그만큼 깊게 스며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잘 만든 공공미술 작품의 존재감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했다. 석촌호수에서 2년 전 선보였던 ‘러버덕(2014)’은 여전히 ‘공공미술’이라는 키워드의 상위 연관검색어로 등장했다. 이후 석촌호수 일대에 전시됐던 ‘슈퍼문(2016)’ ‘1600 판다+(2015)’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다. 대체로 ‘인증샷’용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공공미술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단어가 43.5%였고 부정어는 12.8%에 그쳤다.
‘큐레이터’와 ‘도슨트’ 는 각각 ‘알찬’ ‘따뜻한’ 이나 ‘친근한’ ‘도움되는’ 등의 긍정적인 연관검색어를 가졌으나, 여전히 그 역할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보였다. 특정 전시나 미술관과 구체적으로 관련해 생각하는 경향도 낮았다. 과거 대중이 ‘작가’를 ‘소설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웹툰 작가’로 쓰는 비중이 높아졌다. 대중에게 더 친숙한 존재로 각인되기 위한 태도나 자세를 순수미술 작가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분석은 특정 데이터와 한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만큼 결과물에 한계가 있다고 퍼블릭아트는 설명했다. 예술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바가 대중의 취향과 관심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만 이 같은 빅테이터 분석은 미술과 대중의 접점을 되돌아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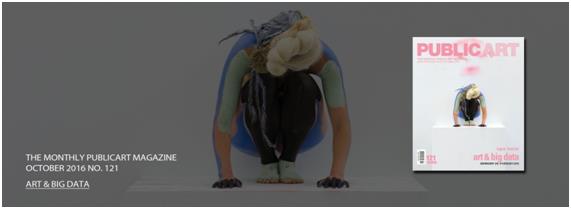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