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진(45)을 만나자마자 대뜸 물었다. 당신을 뭐라 부르면 좋겠냐고. “미술계에서 흔히 쓰는 선생님만 아니면 뭐든 상관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를 설명하는 숱한 단어들 가운데 고작 하나 지워졌다.
음악 팬들에겐 뮤지션으로 익숙할 것이다. 1990년대 인디음악계를 이끈 어어부 프로젝트의 보컬리스트로, 솔로 가수로, 밴드 방백의 ‘백’으로. 그의 음악세계는 기이한 노랫말과 실험적인 사운드, 개성 있는 음색과 창법으로 인해 ‘독특’이란 단어와 묶이곤 했다.
이런 그를 작가주의 성향의 영화감독들이 특히 사랑했다. 백현진은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다.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1997)부터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1998),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2002), 류승완 감독의 ‘주먹이 운다’(2005),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2012) 등이 그의 음악을 실었다. 음악 동반자인 어어부 프로젝트의 장영규와 방백의 방준석도 각각 ‘부산행’(2016)과 ‘암살’ ‘베테랑’ ‘사도’(2015) 등에서 음악을 담당한 유명 영화음악가다.
간간이 카메라 앞에도 선다. 사실 음악만큼 오래 해온 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독립영화에 출연하다 최근엔 상업영화로 발을 넓혔다. ‘특종: 량첸살인기’(2015)의 ‘찌질’한 표절 화가와 ‘해어화’(2016)의 음반 제작자 등 눈길 끈 캐릭터도 여럿이다. 전형성을 한참 벗어난 그의 연기는 음악만큼이나 독특하다. 최근 종방한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에서도 그랬다. 시간여행자인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악역인데 기존 악역과는 결이 달랐다. 시청자들은 “어디서 저런 배우가 나타났냐”고도, “혹시 일반인을 캐스팅했냐”고도 했다.
‘배우’ 백현진이 궁금해 최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그는 “인근 작업실에서 붓질을 하다가 왔다”고 했다. 1996년 첫 단체전에 참여한 이후 국내외에서 수 차례 전시를 연 화가인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에 선정돼 9월 전시를 준비하느라 요즘 한창 바쁘다. 같은 시기 개인전도 연다. 연기에 대해서만 물었지만, 음악과 그림과 인생 이야기가 곁들여졌다. ‘선생님’을 뺀 그 모두가 백현진이니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드라마 출연은 처음이다.
“연출자 유제원 PD가 장률 감독의 ‘경주’(2014)를 인상적으로 봤다더라. 전문가 집단의 기대에서 벗어난 연기인데 괜찮겠냐고 되물었다. TV 드라마가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 열어주겠다는 거다. 이 정도로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이 참에 드라마를 경험해 봐도 되겠구나 싶었다.”
-배역 비중이 컸다.
“소위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피드백을 연기에선 처음 경험했는데 꽤 흥미로웠다. 내 이름을 검색해 보기도 했다. 큰 오락판의 부속이 된 느낌도 들었다.”
-극사실주의 연기였다.
“초반부엔 내 연기를 코미디로 이해하는 분도 있었다. 일부러 어리숙한 느낌을 풍기려 했다. ‘웬 바보인가’ 했을 거다(웃음). 우연한 선택에 의해 악의 수렁에 빠지는 인물이라,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간혹 ‘저게 무슨 연기냐’는 분들도 있는데, 음악을 할 때도 ‘저게 무슨 음악이냐’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웃음).”
-배우 이미지가 한층 강해졌다.
“‘경주’ 이후로 그런 듯하다. ‘특종’과 ‘해어화’ 거치면서 몸값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의 흥행이 썩 좋지가 않다. 예전에 내가 주제가를 부른 영화들도 그랬다.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저주 받은 캐릭터’ 같기도 하다(웃음).”
-이젠 배우라는 자의식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현대미술가라는 자의식, 대중음악가라는 자의식도 없다. 방백 앨범 냈을 때 장르를 물으면 ‘K팝’이라고 대답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영화음악을 할 때 영화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다. 물론 타인에게 내 생각을 강제할 마음도 없다. 어떻게 보든 그들의 몫이다.”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처음 피사체가 되어 카메라 안에 들어간 건 ‘반칙왕’(2000)이었다. 장영규가 음악감독을 맡고 내가 주제곡을 불렀는데 김지운 감독이 우리를 재미있게 생각했는지 룸살롱 오부리 밴드로 출연시켰다. 공연을 하면서 독립영화계 사람들도 알게 됐고. 그렇게 ‘품앗이’를 다녔다.”
-특히 장률 감독과 홍상수 감독 영화에 많이 나왔다.
“‘경주’와 ‘필름시대의 사랑’(2015) ‘춘몽’(2016), 그리고 곧 개봉하는 ‘좋은 날’까지 장 감독이 한국에서 만든 영화엔 다 출연했다. 모두 잠깐씩 나온다. 감독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촬영장에 가는 거다.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최근엔 품앗이 같지 않은 출연작이 늘고 있다.
“그래도 나를 연기자로 택할 때는 음악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 돈벌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도 못 들었던 음악을 꾸준히 했던 게 결과적으로 연기를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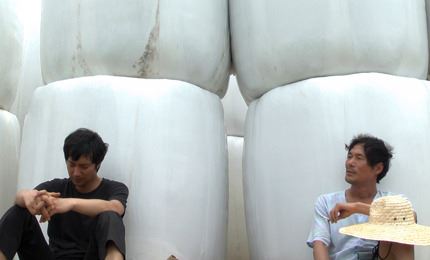
-연기 비중을 높일 생각은 없나.
“연기가 점점 재미있어지긴 한다. 새로운 감독들과의 작업도 궁금하다. 하지만 연기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생활패턴이 바뀌어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소리를 만지고, 작업실에서 붓질을 하고, 그러다 촬영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는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더 욕심내지 않았기에 세 가지 일이 굴러가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 전 유명 기획사에서 전속계약 문의도 왔는데 정중하게 거절했다.”
-배우로서 시장성이 있다는 뜻 아닌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2000년대 초반 즈음 제대로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운이 조금만 따른다면 연기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당시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했는데 그 일보다는 연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때는 연기가 일종의 외도였으니까. 거렁뱅이가 되더라도 비겁해지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연기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하면 하는가 보다’ 여긴다(웃음).”
-단편영화 연출작도 2편이나 된다. ‘영원한 농담’은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영화계에선 단편영화라 하고, 미술계에선 비디오아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난 ‘동영상 작업’이라 부르기로 했다(웃음). 배우 문소리가 두 편 모두 출연했는데 ‘동영상 찍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야한 것이냐’고 묻는다며 낄낄거리기도 했다. 당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영상 매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뿐 다른 생각은 없었다. 다만 3부작으로 완결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업 중인 그림도 올렸더라. 대개 예술가들은 작품의 중간 과정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
“완성이 내겐 큰 의미가 없다. 수정, 발전, 개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하는 거라 본다. 내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림도 우선 붓질을 시작한 뒤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거다. 물리적으로 붓질하는 시간은 줄었고, 그림 옆에서 배회하고 바라보는 시간은 늘었다. 내 작업 방식의 변화도 함께 관찰하는 중이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나이 들다 보면 괜찮은 작업이 나올 것 같다.”
-음악 그림 연기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날은 붓질이 가장 재미있고, 또 어떤 날은 셋 다 아닌, 술자리가 가장 재미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영화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물건’이니까 두루두루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다. 공짜로라도 말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