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미술사학자 김영나(66). ‘국내 서양미술 연구 1세대인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명예교수’보다 ‘박근혜 정권에 찍혀 경질된 전직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떠올릴 이가 많을 터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3월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갑자기 물러났다. 청와대 관심 사업인 ‘한ㆍ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장식미술전’에 반대한 것이 ‘죄목’이었다. 청와대가 전시를 챙긴 건, 6개월 유학한 인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품은 프랑스 사랑 때문이었다. “유쾌하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김 전 관장은 ‘김영나의 서양미술사 100’(효형출판)을 썼다. 관장에 취임한 2011년까지 2년간 일간지에 연재한 글 100편을 엮고 보탰다. “서양미술사 하면 언제까지 50년 전 곰브리치 책만 찾을 건가요. 손 닿는 데 두고 언제든 펴 볼 수 있는 대중서를 쓰고 싶었어요.”
최근 서울 여의도동 카페에서 만난 김 전 관장은 ‘명랑한 여걸’로 돌아와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박)이 오랜 기간 쌓아 온 명예를 내가 더럽힐 수는 없었어요.” 김 전 관장은 청와대에 맞선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관장의 선친인 김재원 박사는 국박의 초대 관장(1945~1970)이었다. ‘부녀 관장’의 꿈을 허탈하게 접은 게 아쉽진 않을까. “사실 욕심엔 끝이 없죠. 없는데… 우리 책 얘기하죠(웃음).”
_당시 전시 내용이 그렇게 문제였나.
“콜베르 위원회(프랑스 명품 브랜드 협회)가 주도하는 철저한 상업 전시였다. 일부 업체에서 박물관에 ‘어떻게 판촉하면 좋겠느냐’고 노골적으로 전화 문의를 할 정도였다. 패션 전시라 반대한 게 아니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1950년대 드레스 같은 건 전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시품 200여점 중) 100점이 2000년대 생산품이었고, 그중 59점이 시판 제품이었다. 국민 세금만으로 운영하는 국가 문화기관인 국박에서 사치품 전시를 할 수 있나. 외국 큐레이터들에 물어보니 국ㆍ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런 전시를 한 전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Very rare)’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나 영국 영국박물관에는 개최 제안조차 할 수 없는 전시라고 했다. 박물관 직원들이 ‘병신년’(2016년)과 ‘병인양요’를 합해 ‘병신양요’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자괴감이 심했다.”
_차관급 정무직 기관장이 청와대 말을 듣는 게 도리라는 비판도 있었다.
“고위 정무직에 전문가를 임명하는 이유가 뭔가. 전문 지식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학자의 양심 차원이 아니라, 본분을 지키려 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나(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상률 전 수석 등이 김 전 관장을 집요하게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는 전시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전시 장소로 국박을 고집했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이 참석하기엔 품격이 떨어지는 전시’라고 했더니, ‘문제가 되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체 무슨 논리인가.”

최근 펴낸 ‘김영나의 서양미술사 100’을 소개하는 김 전 관장. 신상순 선임기자
_책에도 권력과 예술의 미묘한 관계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풍자의 자유가 늘 논란인데.
“권력과 예술 관계의 정답은 없다. 결국 시대의 문제다. 화랑 문화가 정착한 19세기 후반 이전 유럽에선 국가와 교회가 예술을 좌지우지했다. 예술은 수시로 사실을 기만했다. 17세기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이 진 전쟁을 이긴 것으로 묘사했고, 그림 속 나폴레옹은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미화됐다. 끝까지 자기를 잃어 버리지 않은 프란시스코 고야 같은 예술가는 소수였다. 작가가 자유로워진 건 근대 이후다. 현대 들어 빈센트 반 고흐가 상징하는 순수한 예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작가들은 점점 로비스트가 되는 것 같다. 풍자 예술은 늘 있었다. 로마시대 낙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19세기 프랑스의 오노레 도미에는 왕을 풍자했다 수감됐다. 풍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권력자에 달렸다.”
_요즘 한국 미술은 어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새 정부에 조언한다면.
“한국 관객은 꽃 그림 같은 감상적이고 예쁜 작품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건 미술의 아주 작은 일부다. 시대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표현해 통찰을 주는 게 미술의 본질이다. 고야,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현대인이 공감하는 이유다. 국내 작가 중엔 김수자와 서도호 등이 시대 문제를 한국적으로 잘 풀어 내고 있다. 작가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으면 한다.
국박 소장 유물은 36만점인데, 그중 전시 가능한 건 5만점뿐이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은 계속 유물을 구입하는데, 우리는 예산 문제로 못 한다.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는 탓에 발굴 유물이나 기증품에 의존하는 처지다. 100억원짜리 유물은 문화재 시장에서 비싼 축에도 못 든다. 투자가 중요하다. 기증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 관장 취임 때 내가 서양미술사학자라 부적격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민족주의가 주류였던 1980년대엔 ‘왜 서양 미술을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남의 문화를 알아야 우리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건 영원한 진리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현지호 인턴기자(성균관대 경영학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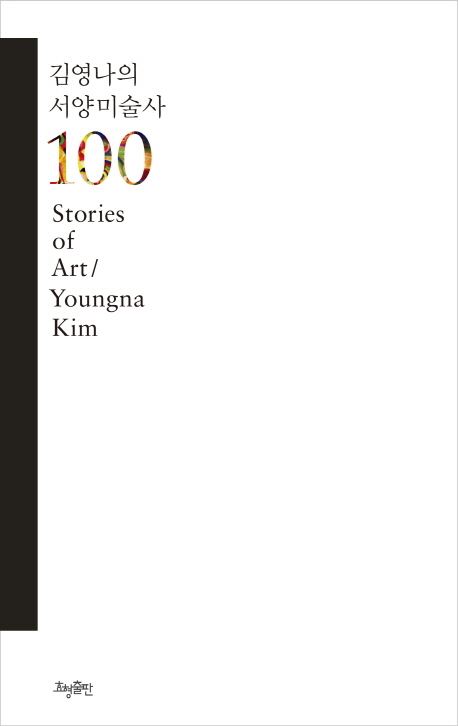
김영나의 서양미술사 100
김영나 지음ㆍ효형출판
448쪽ㆍ2만4,0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