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설립할 수 있어
유령 조합원 동원 조건 맞추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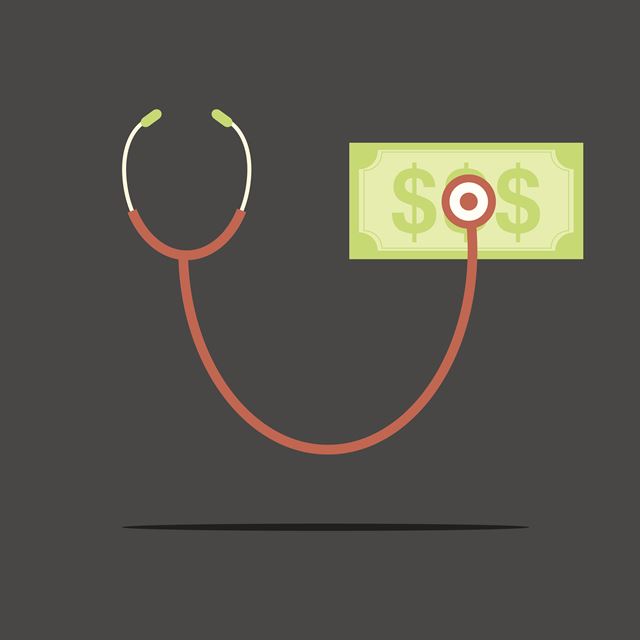
“협동조합 치과에 치료 선금 다 내놨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네요.”
충남 태안군에 사는 김모(53)씨는 최근 ‘협동조합 치과’에 사기를 당했다. 김씨 포함 1,000명 넘는 사람이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2016년 3월부터 K치과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조합 이사장이 지난달 갑자기 폐업 신고하고 자취를 감춘 것이다. 김씨 등이 낸 조합비만 어림잡아 10억원 이상.
김씨는 “조합비를 다 들고 도망간 것뿐 아니라 그간 운영도 과잉 진료비 청구나 부당 진료 등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라면서 “치료비로 710만원 선금을 냈는데 알아보니 다른 병원에서는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경찰은 이사장 행방을 쫓는 한편 해당 치과 대상으로 사기 등 불법행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협동조합 병원’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의료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도입된 협동조합 병원이 조합비 횡령 사기 등 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병원’이라 불린다. 이는 1990년대 초 의료 양극화, 과잉 진료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낸 조합원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 일반 병원과 달리 조건만 충족하면 비(非)의료인도 얼마든지 병원을 만들 수 있다. 2010년부터는 조합원뿐 아니라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님 수의 50%까지 비조합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덕분에 2015년 기준 전국에 600곳 가까운 협동조합 병원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 한 명이 ‘유령 조합원’을 등록해 설립 조건을 충족시켜 병원을 만드는 게 대표적. 실제 2006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요양병원 두 곳을 설립한 A(74)씨는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와 과다 진료 등으로 8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3년6개월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최근 3년간(2017년 기준) 비의료인이 설립한 불법 병원 599곳이 적발이 됐는데 3곳 중 1곳(218곳)이 협동조합 병원이었다. 이사장 등 운영진이 조합비를 들고 갑자기 사라지는 일 역시 심심찮게 벌어진다.
의료 사고 시비도 잦다. 충북 증평군 J병원에서 ‘경추부 신경차단술’을 받은 유모(61)씨는 시술 후 왼쪽 팔이 마비됐다. 주사 바늘이 ‘척수’를 찔러 발생한 의료 사고라는 게 유씨 주장. 그는 “당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도 의사가 명확한 설명 없이 주사를 권유해 시술을 받았다”고 했다.
의료계는 협동조합 병원 문제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형곤 박사는 “본래 취지대로 의료생협이 운영되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도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