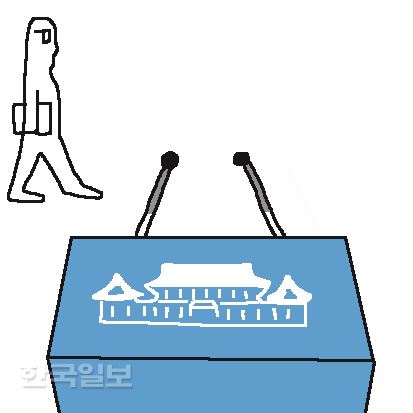
청와대 대변인은 고달픈 직업이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임무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 새벽 5시부터 첫 회의가 열리는 7시까지 2시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느라 휴대전화가 폭발 직전이었다고 한다. 올 2월부터 ‘청와대의 입’을 맡은 김의겸 대변인은 아예 새벽 6시반 브리핑을 정례화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아침부터 대변인과 전화전쟁을 벌이는 수고를 덜었다.
▦ 김 대변인은 '준비된 청와대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며 최순실 게이트 특종 보도했던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런 배경으로 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에 내정됐으나, 언론계에서 청와대로 직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어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청와대에 늦게 합류했다. 청와대는 그를 임명하며 ‘글 잘 쓰는 언론인’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최씨의 의상실 영상을 보도하지 않는 매체를 향해 대의를 위한 정보 공유를 주장할 정도로 승부사 기질도 갖고 있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파문 와중에도 그의 승부사 근성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한 신문이 ‘실패한 로비’라는 자신의 비공식 브리핑을 그대로 인용해 ‘청와대가 김 원장을 감싸고 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하자 그는 “’기사 쓸 게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이튿날 철회한 만큼 굳이 이 표현을 빌미로 정색하며 엮은 기사는 ‘말 꼬리 잡기’라는 그의 항변에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기사 판단 및 배치의 문제를 두고 거친 말로 날을 세우는 모습은 과했다. 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전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더욱 그러하다. 앞서 김 대변인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비유로 북핵 일괄 타결론을 설명했다가 북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히자 ‘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 언론인 특유의 ‘야마(핵심 주제를 뜻하는 언론계 은어) 잡기’ 욕심의 결과라면 걱정스럽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야 한다.
김정곤 논설위원 jk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