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깨어난 나는 가장 먼저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다. 어제 저녁에 내가 앉아 있던 의자와 나무 책상, 그리고 책상위에 흩어진 책들, 컴퓨터, 자판, 마우스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것도 한 치의 움직임이 없다. 이 물건들은 마치 태고부터 그 모습을 간직한 것처럼, 태연하게도 책상 표면에 바싹 붙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심판자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어제의 모습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 심판자는 모든 것을 매 순간 변화시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만든다. 시간은 ‘있음’을 ‘없음’으로 조용히 변신시키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다. 우리가 사는 주위는 2차원의 정지화면이 아니라, 3차원의 역동적인 공간이다. 2차원과 3차원을 구별 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깊이’다. 인류는 르네상스 시대 전까지 주위를 평면으로 보아 표현하였다. 중세 세계관은 개인의 독특한 ‘시선(視線)’을 허락하지 않았다. ‘깊이 본다’는 의미는 남들이 알려준 것들을 찾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나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용기다. 시선은 축자적으로 나의 눈과 내가 보고자하는 대상을 실(線)로 묶는 작업이다. 내 공부방 책장에 꽂혀있는 라틴어 문법책은 저 멀리 있다. 내 눈이 그 책 위에 놓였기 때문에, 눈짐작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깊이’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책상 위 만년필은 라틴어 문법책보다 가까이 있다. 내 눈이 만년필을 가까이 있다고 ‘깊이’ 보았기 때문이다.
시선은 사적이다. 내가 세상을 그저 본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알려준 세상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어리석음이다. 그저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겉모습과 실제가 언제나, 누구에나 일치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객관적인 모습을 참되며 옳다고 착각하여 ‘도그마’로 만든다. 그러나 ‘깊이 보는’ 시선은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내가 여기 앉아있고 어떤 자가 저기 앉아서 동일한 대상을 본다할지라도, 나와 그(녀)가 관찰을 통해 얻는 정보는 달라야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혹은 내가 동일한 대상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내 눈의 위치에 따라, 예를 들어 곁눈질로 보거나 정면으로 응시할 때, 그 모습이 달라진다. 혹은 하루의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보느냐에 따라 대상의 모양이 달라진다.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여, 태양 빛의 양과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선은 또한 개인적이다. 내 위치는 사물을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문법이다. 나에게 운명적으로 던져진 나의 배경 안에서 세상을 해석한다.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이 없다면, 세상은 나의 눈이 되어 나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교본을 제공할 것이다. 시선의 출발점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다. 자신을 깊이 응시하는 자여 자신의 위치와 위상을 아는 자만이, 자신이 보는 대상을 해석할 수 있다.
배움은 바로 이 순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수련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제까지의 세계는 탈출의 대상이다. 그 경계를 확장하여, 지금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만의 시선으로 관찰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배움은 객관적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보호하는 장치다. 과거의 지식은 나의 붉은 색 색안경에 불과하다. ‘나의 과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붉은 색안경’이다. 인간이 과거의 배움을 덜어내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쌓기만 한다면, 색안경은 더욱 두텁게 다양한 색으로 더해져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앎’이란 개인이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독특한 시선들의 집합이다. 서양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 ‘그네’(*gn-)다. ‘앎’이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개성이자 정체성으로 만들려는 인내의 과정이다. 서양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동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 ‘앎’을 시도한 사람의 정신 상태인 ‘형용사’다. ‘안다’라는 의미의 영어동사 ‘노우(know)’나 ‘앎’이란 영어단어 ‘날리지(knowledge)’가 이 어원에서 파생했다.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속한 셈족어에서도 ‘안다(yada)’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주체와 객체의 긴밀한 관계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지식이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인 ‘야다’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을 뜻한다. ‘안다’는 의미는 정신적이며 동시에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몸에 벤 삶에 대한 시선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매일 마주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서서히 만들어진다. 나는 그 대상을 어제의 지식으로 보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대상위에 시선을 두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가?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의 색안경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눈과 내 눈을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하여 가만히 응시하는가?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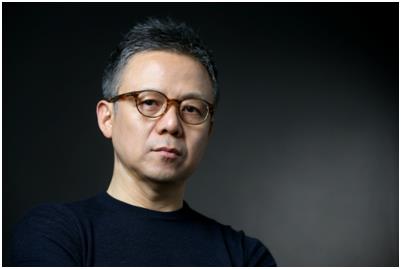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