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동네에서 좀 뛰어 놀았다고, 직장인이 퇴근 후에 술을 좀 마셨다고 어딘가에 갇혀 구타당하고,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이번 주,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형제 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수기 ‘살아남은 아이’ 그리고 ‘숫자로 남은 사람들’ 입니다.

40여년 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이유로 ‘사회를 정화’한다며 ‘부랑인 정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부랑인 수용소, 즉 복지원에 사람을 수용시키면 경찰은 상점을 받고, 복지원은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부랑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예를 들어 역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던 고등학생까지. 시와 경찰에 의해 ‘형제 복지원’이란 곳에 강제로 수용 당합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성폭력, 이유 없는 구타와 전체 기합, 대가라곤 폭력뿐인 강제노역. 실재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생생한 증언으로 재구성됩니다.

87년, 감옥보다 더 감옥 같았던 복지원의 실체가 밝혀지지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운영된 곳이었던 만큼 원장은 인권 유린, 특수 감금 등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고 국고횡령죄로 고작 2년 반의 징역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 잡혀온 사람들은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대다수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거리를 떠도는 진짜 ‘부랑자’가 돼버립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당시의 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98년의 충남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2005년 ‘도가니’로 알려져 있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여전히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가난하거나, 살 집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사는 이웃이 아니라 ‘격리’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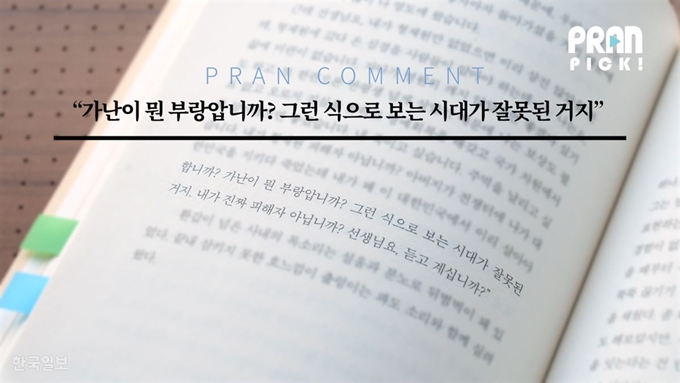
오늘의 프란 코멘트는
‘숫자로 본 사람들’ 속 피해자의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가난이 뭔 부랑압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시대가 잘못된 거지”
프란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고은 PD rhdms@hankookilbo.com
이현경 인턴PD
현유리 PD yulsslu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