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18>서정주, ‘화사집’(花蛇集)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기퍼도 오지 않었다./ 파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 아들.”(시 ‘자화상’)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처음 읽던 순간을 기억한다. 누군가 나를 가격한 것처럼 아득해졌다. “애비는 종이었다”고 말할 때 그 선득한 느낌, 절정의 순간에서 단도직입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때 알았다. 시가 이런 거구나.
‘화사집(花蛇集)’은 1941년에 나온 서정주(1915~2000)의 첫 시집이다. 이 시집은 징그럽다. 아름다워서, 끔직해서, 어두워서, 귀기(鬼氣)가 서려있어 징그럽다. 도깨비가 이쪽을 노려보며 내뱉는 독백 같다. 그는 귀신이 돕는 시인이다. 그가 신의 목소리를 흉내 낼 때, 능글맞고 완벽하다. “꽃다님” 같다. ‘화사(花蛇)’에 나오는 꽃 같은 뱀이 이 시집의 얼굴이다. 힘이 센데, 목소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힘이 ‘수평으로’ 누운 느낌이다.
이미 거장의 솜씨로 첫 시집을 빚은 뒤, 그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좋은 시들을 줄줄이 써냈다. 전집을 읽어보면 태작 없이, 한국말을 이토록 아름답게 쓰는 게 가능한가,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서정주는 친일시와 군사 독재자에게 바친 찬양시 등, 정치적으로 큰 과오를 저질러 재평가 받는 중이다. 교과서에서 시가 빠지고, 문학상이 폐지되고, 시를 읽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독자들은 ‘친일 행적’의 원죄를 지닌 그의 시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꺼린다.
물론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훌륭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 시인이 반드시 훌륭한 인간이어야 할까. 반듯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간만 시를 써야 하는가. 더러는 비루한 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말간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후 읊조리는 독백도 시가 되지 않던가. 보들레르를 생각해 보자. 마약과 문란한 사생활, 무분별한 사치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았다. 그 역시 흠 많은 인격으로 숱한 과오를 저지르며 일생을 살았지만 그의 시집 ‘악의 꽃’은 문학사에 남았다.
나는 서정주의 과오를 덮어 주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의 삶만 들여다보면, 그는 누추하고 비겁한 삶을 살았다. 그의 과오는 엄중히 따져 묻되, 그의 뛰어난 ‘문재’는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나 개개인의 과오는 지우고 제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서정주의 삶을 평가하는 동시에, 작품을 정당하게 평가할 의무도 있다. 한국어의 소슬한 경지에 가 닿은 그의 시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석류꽃은/ 영원(永遠)으로/ 시집가는 꽃” 서정주는 석류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시인이다. 당신은 영원으로 시집가는 꽃을 아는가? 그 아득한 생의 얼굴을 보았는가? 그러니 미워하자. 무조건 내치지 말고, 그의 행적을 엄중히 비판하고 미워하면서 읽자. 이 슬픈 뱀을 들여다보자.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라운 몸둥아리냐” 한탄하며 슬퍼하자. 용서 없이, 그의 옹졸한 삶을 책망하며, 끔찍하고 매혹적인 그의 시들을 마주하자는 얘기다.
시는 잘못이 없다. 시는 시인을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다. 독자를 위해서도 아니다. 시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스물 셋 난 청년 시인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던가.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병든 수캐처럼 걸어왔다고. 그는 시인의 직관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천치가 될 것임을 알아차렸을까. ‘수대동시’라는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흰 무명옷 갈아입고 난 마음”,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살았구나”라고!
박연준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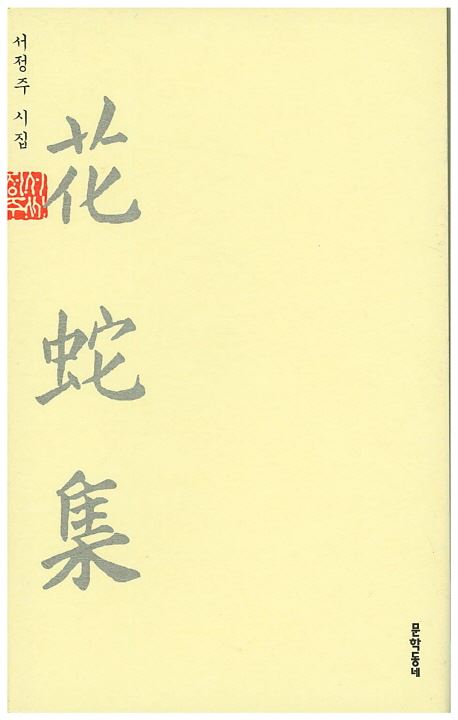
화사집
서정주 지음
문학동네 발행ㆍ59쪽ㆍ8,5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