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의 실크로드 천일야화] <54> 마사이를 만나다
결혼생활에 품앗이 개념 도입한 마사이족…해발 2000m 안팎의 응고롱고로가 유토피아

한 눈에 알아봤다. 빨강 파랑 원색 계통의 망토를 걸치고 소 치는 막대기 ‘은구디’를 들고 있는 부족은 어김없이 마사이족이었다. 남자들은 허리에 ‘오랄렘’이라는 쌍날단도와 축소판 골프채 모양의 나무방망이 ‘오링가’를 차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대표 원시부족인 마사이족을 원 없이 본 것은 행운이었다. 이들 부족 35만여명이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 일대에 산 덕분에 사파리를 오가는 길에서는 어김없이 마사이를 만날 수 있었다.
길에서 만난 마사이 여성들은 하나같이 짐을 나르고 있었다. 바구니를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기도 했고, 이마에 두른 띠로 등짝의 큰 가방을 지탱하기도 했다. 도로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문명과는 담쌓고 사는 마사이 부족마을이 세렝게티로 통하는 길목에 하나 있었다. 도로를 벗어나 5분 정도 달리니 널찍한 평지 한 켠에 울타리를 쳐놓은 마사이의 보금자리가 나왔다.
“잠부”(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오가는 동안 30여명의 마사이 부족민들이 모여들었다. 남성들은 은구디, 여성들은 흰 모자와 목장식을 착용한 채 환한 얼굴로 이방인을 반겼다. 자세히 보니 남성들 귀에도 커다란 구멍이 보였다. 쇠붙이 장신구를 달아 귓볼이 늘어질수록 미남 미녀라고 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민속촌 방문은 관광상품이었고, 흥정은 필수였다. 20달러를 요구했다. 10달러로 낙찰봤다. 남성들이 춤과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는 용감한 마사이다. 독수리야 나를 따라와라. 적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적을 죽인다. 독수리 너는 어쨌든 먹이를 챙길거다.” 여성들도 제 자리에서 살랑살랑 몸을 움직인다.

누가 집으로 손을 이끌었다. 입구에 놓인 가시덤불이 문이었다. 움막처럼 생긴 집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곳은 부부가 지내는 방, 자녀와 동물이 지내는 공간, 부엌으로 3등분 되어 있었다. 자녀와 동물이 헛간 같은 바닥에서 같이 뒹군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대낮인데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했다. 물론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다. 소와 양을 키우는 일은 남성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도 노동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성들은 동네 여기저기 모여 앉아 수다 떠는 게 일이었고, 여성들은 가축 키우고 기념품 만들며 애 키우는 일도 도맡아했다.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남성은 아내를 20명까지 두기도 한단다. 마사이는 남성의 천국이었다.

한때 남성들도 청년 전사인 ‘모란’이 되기 위해 혹독한 시기를 거쳤다. 소년들은 12세가 되기 전에 할례를 하고 양쪽 볼과 팔, 발에 불칼로 자국을 남기는 성인식을 거친다.
병사촌에 수용되는 이들은 소를 방목하는 방법과 사냥, 수렵 등을 통해 전사로 태어난다. 사냥에 성공하면 맹수의 피도 마신다. 평소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처럼 먹는 이들은 소 피도 즐겨마신다. “그걸 어떻게 마시냐”라고 손사래치다가 선짓국이 잠시 머리를 스쳤다. 옛날에는 맹수가 소나 양을 잡아가면 반드시 복수를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를 금지하면서 전사들이 설 땅이 없다.

야만적 여성할례를 거친 소녀들은 병사촌을 찾아 마음에 드는 청년을 3순위까지 정해 풋사랑을 나눌 수 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남성이 허약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친구가 대역으로 나서기도 한다. 출산이 결혼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부족은 부부생활에도 품앗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먼 길을 나선 모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모란의 창이 집 앞에 꽂혀 있으면 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하니 에스키모인은 저리 가라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21세기인데도 사람사는 모습은 참 많이 다르다.

오링가를 10달러에 사는 것으로 마사이 부족마을을 떠났지만 정작 마사이인들이 살고 싶은 곳은 응고롱고로였다. 이곳 분화구 안이 동물의 낙원이라면 바깥은 마사이 천국이었다. 해발 2,000m 안팎의 이 땅은 마사이족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유토피아였다. 이곳 흙길 곳곳에서 소떼를 몰고 있는 마사이족과 마주쳤다. 평원 한 가운데 울타리 안은 사람이 거주하는 움막과 가축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다. 어차피 문명과 담 쌓을 요량이면 응고롱고로가 선택받은 땅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프리카를 통틀어 문명을 거부한 부족이 하나 더 있다. 대륙의 남단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족이다. 인류학자들은 산 또는 사 부족이라고 부른다.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부족인 6만여명은 평균 150㎝의 키에 황갈색 피부를 갖고 있다.
이들은 농경과 목축생활과는 담을 쌓고 있다. 오로지 사냥과 수렵이다. 족장이나 추장이 없는 이들 부족에서는 사냥 솜씨가 뛰어난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부족은 절대로 과소비를 하지 않는 미덕을 갖고 있다. 꼭 필요한 짐승만 사냥하고, 야생 열매를 발견해도 씨앗은 남겨둔다.

키 얘기가 나오면 피그미족을 빼놓을 수 없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가봉 일대에 15만명이 살고 있는 피그미족은 난쟁이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약소 부족이지만 낙천적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부족 얘기는 결코 즐겁지 않다. 1884년 베를린회의를 통해 유럽 강국은 아프리카를 가로 세로 난도질했다. 부족 간 생활권도, 낙차 큰 강줄기도 고려되지 않았다.
후투족과 투치족이 학살전쟁을 벌인 르완다는 대표적 사례다. 1961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르완다에서 전체 인구의 10%인 투치족이 85%나 되는 후투족을 지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1994년 후투족 지도자 2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주범을 가리기도 전에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인종청소에 나섰다. 100일 만에 80만명이 살해됐다.

불똥은 콩고로 옮겨붙었다. 후투족 난민들이 투치족을 공격했는데도 콩고는 방치했다. 콩고 투치족도 우간다의 지원을 받고 수도 킨샤샤로 진격해 콩고 정규군을 단번에 제압했다. 콩고 전쟁에는 8개국 25개 무장세력이 개입했다. 2008년까지 전쟁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은 5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콩고 전쟁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피그미족이었다. 반군 정부군 가리지 않고 피그미족을 동물처럼 사냥했다.
이런 비극의 뒤에는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이 있었다.
글ㆍ사진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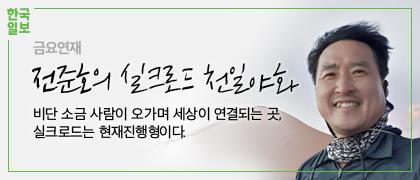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