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하얀 눈이 덮인 설악산 울산바위와 선명한 노란색을 띤 노송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사진 한 장. 강원 고성으로 단번에 달려가게 한 이유였다.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사진 속 장소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주변을 헤맨 끝에 자동차 라이터 불빛 너머로 어렴풋하지만 낯익은 풍경을 맞이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진 앵글을 보고 삼각대를 놓고 정신 없이 촬영에 빠졌다. 이쯤 하면 원하는 사진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삼각대를 접으려는 순간, 동해에서 떠오는 해가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다.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금까지 느꼈던 아름다움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곳곳에 불에 타고 몸통이 잘려 나간 채 뿌리만 남은 나무들이 즐비했다. 베어져 야산에 버려진 시커먼 나무들은 흡사 전쟁이 휩쓸고 지난 뒤 폐허를 연상케 했다. 낯선 풍경에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을 추스른 뒤 나지막한 산으로 향했다. 풀 한 포기 없이 마사토로 뒤덮인 산을 오르는 것은 진흙탕을 지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다. 얕은 야산이었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정상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산 곳곳에서 불에 탄 나무들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때마침 떠오르는 해와 어울려진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이 되고 있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고사목과 어우러진 일출의 모습과 흡사하달까.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풍경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 슬픈 풍경이라 더욱 안타까웠다. 올 겨울 보기 힘들었던 눈 내린 설악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상처 입은 나무들. 하지만 이런 풍경도 조만간 보지 못할 것 같다. 불탄 나무들이 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벌채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군 관계자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봄이 오면 숨었던 새 생명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 달 4일이면 고성산불이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고, 일부나마 살아남은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나 황폐한 땅에 위로가 되길 기원해 본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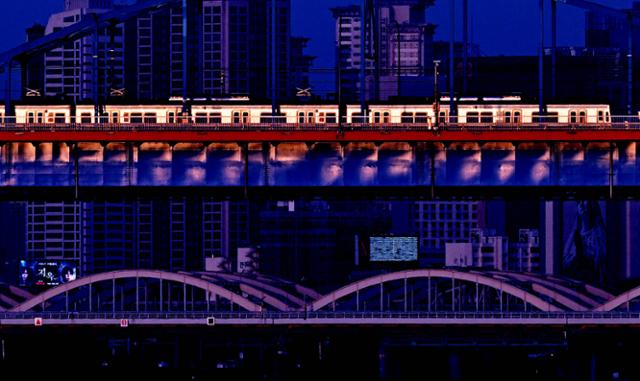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