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재 시인은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전환을 위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훤강
“심청이 아빠에게/공양미 삼백석 영수증을/건네며 말했다//다음엔 아빠가 빠져//온종일 물을 긷던 콩쥐가/팥쥐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우리 가출하자//마침내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고/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웠다//토끼야, 바다로 가야겠다”(‘전환학교’ 부분)
왜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콩쥐는 이복자매와 갈등해야 하고, 토끼와 거북이는 대결해야만 할까? 왜 이야기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채, 이것들을 ‘교훈’이라고 여겨왔을까? 이문재 시인은 “이야기를 바꿔야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학교 종이 울리면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는 대신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바꿔 말하자고.
이 시인의 신작시집 ‘혼자의 넓이’는 이처럼 ‘질문의 전환’, ‘이야기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바꾸자고 재촉하는 시로 빼곡하다. 1982년 시 동인지 ‘시운동’을 통해 데뷔, 생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정적 시 세계를 펼쳐온 시인의 목소리가 집약돼 있다. ‘지금 여기가 맨 앞’ 이후 7년 만의 시집으로,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시인은 여전히 자본주의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전작에서 시인은 “진정한 시인이 모두 심오한 생태학자인 것처럼, 진정한 시인은 모두 미래를 근심하는 존재”(‘마음의 오지’)라고 말했다. 이 존재론은 이번 시집에서 한층 나아간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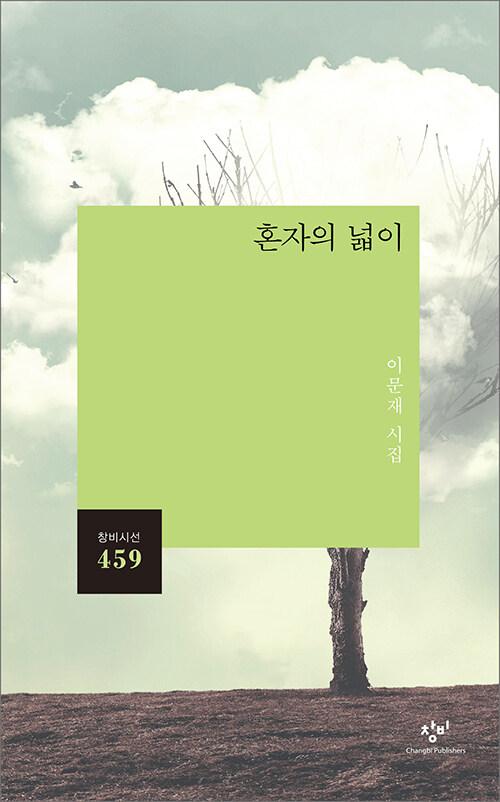
이문재 '혼자의 넓이'. 창비 발행. 208쪽. 9,000원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 미래를 빼앗긴 다 자란 아들딸들이/지구 표면 곳곳에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가족이 탄생하고 도시가 번창한 이래/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식을 착취한 적은 없었다/아버지가 가진 것은 죄다 불법이다 죄다 장물이다/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죄의 목록이 길어지고/아버지가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미래를 미래에게 돌려줘야 한다”(‘삼대-미래를 미래에게’ 부분)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시인이 제시하는 방법은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며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있”(‘사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때의 ‘혼자’는 자발적으로 이탈한 단독자나 개인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타자와 조화롭되 같아지지 않으며, 동시에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수록 잘 듣게 되는 것은 당연히 나무와 땅, 지구의 소리다.
“성인이라면/어디 사람 말만 듣겠는가/하늘땅은 물론 푸나무 짐승 바이러스/심지어 기계가 하는 말까지 다 들릴 터/(…)/작은 귀 몸보다 크게 열리니/어디선가 들려오는 뜨거운 말 한마디//땅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땅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지구의 말’ 부분)
참다운 문명과 지속가능한 생태는 시인의 초기작부터 꾸준히 강조되어온 사상이다. 그 외침이 절박하지 않은 적은 없었겠으나, 시인이 시를 써온 40년간 지구의 변화 속도는 그 절박함마저 따라잡았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사라진다”는 시인의 긴급한 호소가 전혀 낡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해진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실이다.
시인의 문체는 점차 단순해지고 지구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시인은 한 인터뷰에서 “젊었을 땐 문체에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이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지에 중점을 둔다”고 말한다. “시를 쓰는 것은 공적인 행위”이며, “후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독자의 역할이다. 이제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