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터키 소방관들. AP 연합뉴스
잠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열기에 휩싸여 지낸 올림픽 기간이었다. 심장을 쿵 하고 때리는 순간도 무수히 만났고, 짜릿한 승리의 미소만큼이나 안타까운 좌절의 눈물도 보았다. 어느 패배가 아쉽지 않으랴만, 경기가 끝난 후 코트에 주저앉아 우는 터키 여자배구 선수들은 유독 맘에 남았다. 역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 상대였던 게 괜스레 미안도 하고, 터키에 퍼진 산불사태를 걱정한 눈물이라는 뒷이야기도 들어서였다.
터키를 삼킨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지는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 사시사철 태양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드는 휴양지인데 올해는 그 찬란한 태양이 선을 넘어 버렸다. 연예인 파파라치 컷이 찍혔다면 십중팔구 여기였을 만큼 화려한 별장지역에서는 허둥지둥 탈출하는 이들의 낯선 모습이 담겼고, 항구 뒤로 멋지게 자라던 소나무들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허연 잿더미로 변한 숲에 지친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쓰려져 잠든 장면을 보며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다.
같은 마음이었을 게다. 우리 여자배구의 팬들은 선수들 이름으로 터키에 묘목을 보내주는 응원을 시작했고, 줄줄이 이어지는 기부에 터키 홈페이지에는 한글로 감사인사가 걸렸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한 우정의 순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2년 월드컵에서 3위냐 4위냐를 정하는 경기에서 패한 후, 우리 축구팬들은 터키국기를 관중석에 내걸었다. 진 것만으로도 속상할 텐데, 되레 승리를 축하해주는 광경에 축구사랑이 유난한 터키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졌다. 이후로 터키를 다니다가 축구팬을 만나면, 그때 고마웠다는 인사를 대신 듣기도 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를 지키던 주인이 불쑥 말을 걸며 ‘칸 카르데쉬’라는 터키어를 알려줬다. 한국과 터키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인데, 그만큼 많은 터키인의 피가 우리 땅에 뿌려졌다는 말이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한국전쟁의 훈장을 단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당시 사진을 보관한 자손들을 마주치는 건, 터키를 여행한 이들에게는 흔한 이야기였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데다, 최전선에서 싸운 탓에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된 이까지 합하면 참전군인 넷 중에 한 명은 죽거나 다쳤으니 말이다.
앙카라 기차역 근처 ‘한국 공원‘의 탑에는 이때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태어나고 죽은 연수를 얼핏 헤아려 보면 갓 스물 안팎. 그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다 보면, 참전 결정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는 차치하고 어쩔 수 없이 눈시울부터 뜨끈해진다. 며칠 여행의 기억만으로도 국제뉴스가 각별해지는데, 내 오빠와 아빠를 보냈던 나라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오랜 우정이었다.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가 검게 솟아오르는 연기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신문사진 한 장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대변한다. 안타깝고 두렵지만 어디부터 무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마음. 어쩌면 연대라는 건 측은지심과 작은 선의로부터 이뤄질지도 모르겠다. 바이러스며, 기후위기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속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소소한 유머를 끝끝내 지켜내며 꿋꿋하게 통과해야 할 시간이다. 부디 함께 걸은 덕분에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돌아보며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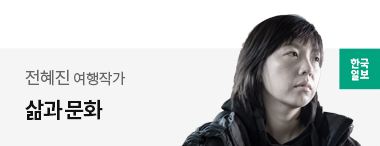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