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냘픈 표피 곳곳, 벌레가 파먹은 ‘흉터’
그런 내게 행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깊어진 가을이 나를 홍시처럼 물들이자
붉어진 몸이 상처를 가려 설움이 녹는다
서둘러 온 첫서리에 짧은 행복은 끝나고
바람 불면 끊어질 추풍낙엽의 신세
모래성처럼 부질없는 불안한 나날 속
있는 힘껏 가지에 매달려 발버둥 치지만
이젠 한 몸이었던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
어느 따스한 봄날, 다시 돋아날 것을 믿기에
잠시 이번 생애를 떠나 내세를 기약해야지
흩날리는 서리에 ‘부활의 꿈’은 익어간다.

단풍 명소인 강원 인제군 갑둔리 '비밀의 환원'에 첫서리가 내린 16일 단풍이 들지 않은 잎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인제=왕태석 선임기자

단풍 명소인 강원 인제군 갑둔리 '비밀의 환원'에 첫서리가 내린 16일 억새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인제=왕태석 선임기자

단풍 명소인 강원 인제군 갑둔리 '비밀의 환원'에 첫서리가 내린 16일 길가 쑥부쟁이꽃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인제=왕태석 선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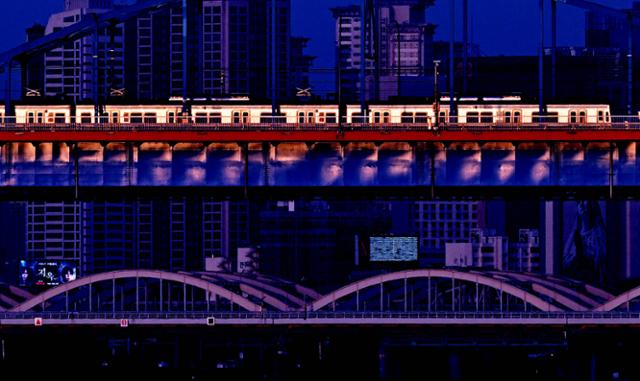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