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린 스틸 '어떻게 먹을 것인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일 무렵 미각 상실 후유증에 따른 좌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이도 적지 않았다. 좋은 음식이 매개가 되면 낯선 이와의 대화가 두렵지 않다. 여행의 만족은 많은 경우 식도락에서 온다. 그러니 매사에 기쁨이 줄었다는 고백도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다.
영국의 건축가이자, 음식으로 도시 문제를 풀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 온 연구자인 캐롤린 스틸이 삶의 전반을 다룬 에세이의 질료로 음식을 고른 것도 그래서다. 음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는 스틸은 신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서 음식과 관련된 삶의 이면을 살핀다.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전작 '음식, 도시의 운명을 가르다(Hungry City)'에 이어 음식과 인류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비롯한 21세기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시련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원제인 '시토피아(Sitopia)'는 그리스어 '음식(sitos)'과 '장소(topos)'의 합성어다. 음식 문화가 삶의 핵심에 자리한다는 의미다. 저자는 음식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면서 문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와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음식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음식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린다. 산업화된 세계에서 음식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 하면서 음식의 가치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값싼 간편식의 등장으로 한때 부자의 특권이던 편리함을 누구나 만끽할 수 있게 됐지만, 미각의 기쁨은 멀어졌다. 기업의 초가공 식품, 패스트푸드 시장 등이 커지면서 미각은 흐릿해지고 건강 악화, 비만은 늘었다.
책은 음식 자체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 음식을 매개로 한 몸과 집, 사회, 도시와 시골, 자연과 시간에 관한 총 7개의 장(章)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현대의 삶이 맞닥뜨린 위험을 이야기한다. 가령 디지털 전환이 아무리 빠르게 이뤄져도 어떻게 먹는지가 결국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시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음식 문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모색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역사,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참고 문헌을 능숙하게 엮어내 밑줄 긋고 싶은 대목이 많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캐롤린 스틸 지음·홍선영 옮김·메디치미디어 발행·560쪽·2만8,0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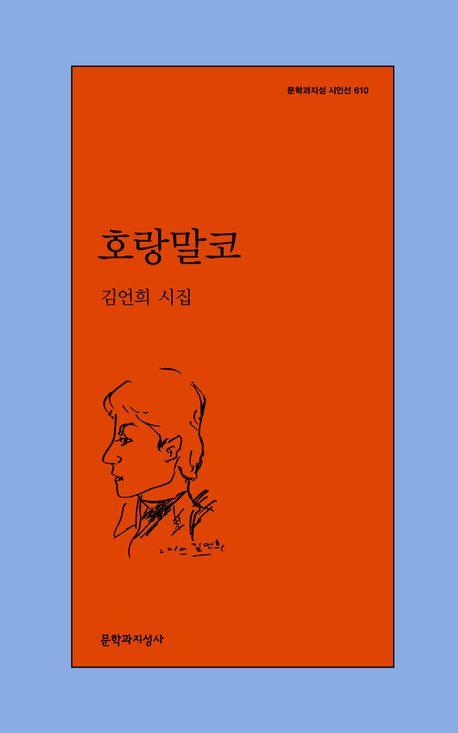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