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 소나무 숲에서 발견한 세한송백의 풍경, 온몸에 새하얀 서리를 덮어쓴 소나무는 지금껏 흔히 보았던 푸른 소나무와는 또 다른 장엄한 모습이었다. 태안=왕태석 선임기자
한겨울 소나무를 표현하는 고사성어 중에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는 말이 있다. 겨울에도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일컫는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추위 속에서도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지조와 절개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 소나무 숲에서 이런 모습이 잘 어울리는 풍경을 발견했다. 입춘이 지나면서 큰 추위가 물러갔지만, 도시와 떨어진 전원에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한겨울 못지않은 서리를 만날 수 있다.

밤새 온몸에 새하얀 서리를 덮어쓴 소나무에 아침 햇살이 번지자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날도 시골길 산 아랫자락 음지에서 푸른빛 소나무에 살포시 내려앉은 흰색 서리를 마주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온몸에 새하얀 서리를 덮어쓴 소나무는 지금껏 흔히 보았던 푸른 소나무와는 또 다른 장엄한 모습이었다. 이런 소나무가 빚어낸 풍광에 취해있노라니 눈앞에 한두 방울의 물이 뚝 떨어졌다. 비가 오나보다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봤지만, 하늘은 한 점 구름이 없었다. 어디서 떨어진 물방울일까?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온몸에 새하얀 서리를 덮어쓴 소나무에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다.
해가 산봉우리 너머로 떠오르면서 솔가지에 붙은 서리가 녹아 물이 된 것이었다. 조금 지나 햇살이 번지면서 서리는 사라지고 소나무는 본래의 푸른색으로 되돌아왔다. 올 한해는 유난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면 한 줄기 햇살이 소나무를 감싼 서리를 녹아내리게 하듯, 우리의 삶도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겨울 풍파를 견디는 세한송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침이다.

이른 새벽 온몸에 새하얀 서리를 덮어쓴 소나무는 지금껏 흔히 보았던 푸른 소나무와는 또 다른 장엄한 모습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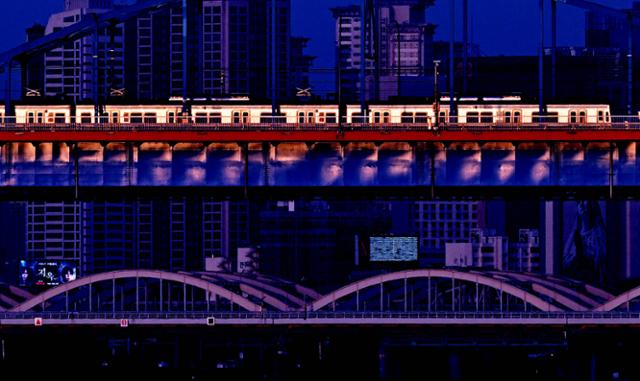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