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의사 부족에 온 나라가 비상
자부심 느끼며 덜 힘들게 일하도록
의대 증원하고 병원 고용 늘려가야

게티이미지뱅크
“교수님 사시는 걸 보니까 실력 있고 유명해질수록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 없고 유명해지지 못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요. 솔직히 그런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최근 의대 재학생에게 들은 얘기라고 했다. 흉부외과를 선택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학생이었는데, 본과 3학년쯤 되니 다짐이 흔들리더란 것이다. 교수는 그 학생에게 흉부외과를 더 권하지 못했다. 툭하면 병원에서 쪽잠 자고, 정시 퇴근이나 제때 식사는 운 좋은 날에나 가능한 생활을 물려줄 수 없어서다. 큰 병원에 남지 못하면 개원도 쉽지 않은 흉부외과가 청년 의사의 눈엔 ‘불확실한 미래’라는 데 공감해서다.
의사가 모자란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경고는 십수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가(진료비) 인상, 응급의료센터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 도입 등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으론 당장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수가는 전에도 조금씩 가산돼왔지만, 의사 부족을 해소하진 못했다. 돈만으로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나아지지 않았겠나. 게다가 가뜩이나 일할 사람 없는데 센터 늘리고 다른 병원 당직까지 서라니 기존 의사들은 뼈를 갈아 넣으란 얘긴가. 병원이 필수의료 의사를 더 채용하면 될 텐데, 병원들은 오는 의사가 없다 하고 의사들은 갈 병원이 없다 한다. 이 ‘미스매치’를 해결할 묘수를 찾는 게 한시가 급한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논의를 중단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유라니, 답답하다.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사도 많다. 과로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3일 열렸다. 생전에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많다는 걸 의사 말고 누가 동의할까”라고 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의사단체가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의대 정원 늘릴 때가 됐다”고 했다. 3분 말고 적어도 13분은 의사를 만나고 싶은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의사가 안 부족하다는 쪽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 유인이 없는 걸 근본 원인으로 짚는다. 맞는 지적이다. 생명을 살리는 자부심으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염두에 뒀다가도 고된 근무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국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마음을 바꾼다. 개원한 피부과 의사는 칼퇴근하고 주말을 즐기는데, 종합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여가는커녕 잠도 푹 못 잔다. 흉부외과를 포기한 후배 얘길 해 준 의사는 “돈을 수십억 벌어도 삶의 대부분을 일과 병원이 차지한다면 그런 삶을 살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필수 진료과에 의사가 모이려면 궁극적으로 자부심과 삶의 질을 다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힘들지만 돈 많이 주는 일 할래, 돈은 덜 받지만 여유 있는 일 할래 물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요즘 세대라고들 한다. 의대생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를 늘리고 병원이 그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해서, 한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함께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을까.
마침 의대에 가고 싶다는 이공계 학생이 넘쳐난다. 어떤 의사 말마따나 “무시무시한 우등생들”이 해마다 의대 문을 애타게 두드린다. 그들 상당수는 자의든 타의든 애초에 고소득이 보장되고 저녁 있는 삶을 누리는 진료과가 목표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저 생명을 살리고 싶어 의사를 꿈꾸는 학생도 여전히 있을 거라 믿는다. 기꺼이 응급실을 지키고 한밤중에라도 메스를 들 학생이 꼭 의대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덜 힘들게 일하면 좋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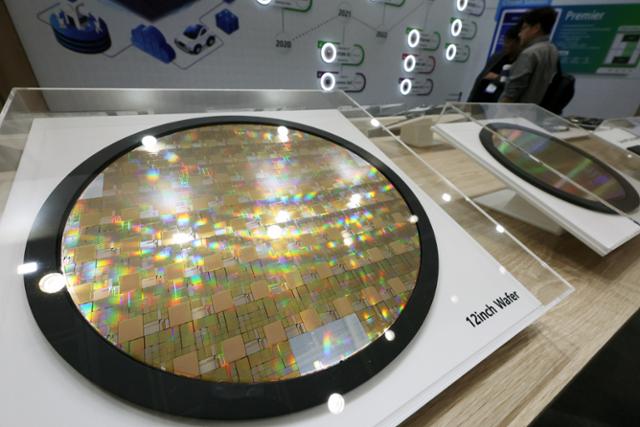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