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서 만난 불 켜진 구멍가게. 새벽녘이라 인적이 끊겼지만, 환한 불빛이 마치 험난한 바닷길에서 만난 등대처럼 반가웠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이른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돈다.
이른 새벽 어린 시절 살았던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만 휑한 골목길은 주변이 캄캄했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이맘때의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집집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고, 새벽잠을 깨우는 식구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담을 넘어 이웃집으로 퍼졌다. 그러나 지금 영도 골목길 집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살며 낯선 발소리에 놀란 개가 ‘왕왕’ 짖을 뿐이다. 이른 아침엔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돈다.

이른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돈다.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당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았던 골목길은 ‘놀이터’였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이웃집의 대소사를 챙기는 ‘교류의 장’이었다. 앞뒷집은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을 만큼 가깝고 정이 넘쳐났다. 비 오는 날 김치전이라도 부치면 골목길은 잔칫집이 되었고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상갓집 마당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골목길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젠 ‘재개발’ 명분으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의 터전이 되었다. 정겹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을 만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했다.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새벽 가로등만 휑한 부산 영도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참을 걷다 지칠 때쯤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구멍가게를 만났다. 새벽녘이라 인적이 끊겼지만 환한 불빛이 마치 험난한 바닷길에서 만난 등대처럼 반가웠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구멍가게처럼 정다운 골목길도 온기로 따뜻해지길 기원해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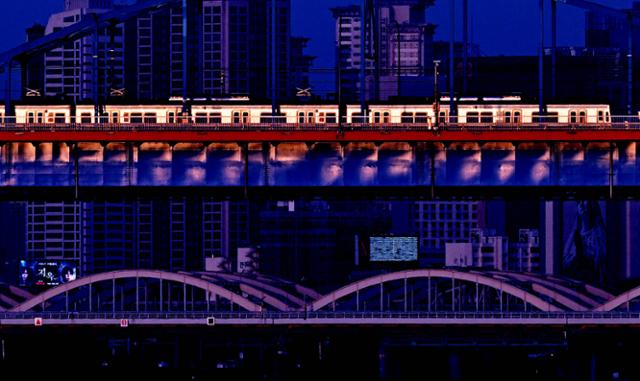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