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88년생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93년생 곽민해 뉴웨이즈 매니저가 2030의 시선으로 한국정치, 한국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 제도 TF 제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언어는 때로 기만적이다.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되는 외형이 그 본질을 담보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언어가 그 자체로 갖는 상징성은 적지 않아서 그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을 부정적인 것으로 일축해버리기도 한다. 국민, 민주, 정의 같은 단어들이 그렇다. 마치 이를 당명에 채택한 정당들처럼, 이런 단어의 사용이 그 본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들 단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직접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된다.
"공천권을 당원에게 드리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멋있다. 마치 권력자가 쥔 막강한 권한을 하나하나 해체해 당원에게 나눠주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여야 불문 많은 정치인이 공천권을 당원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책임당원이 비례대표를 결정하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당원에게 당권을 돌려드리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강조했다. 사실 이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에게 물으면 열에 아홉은 이런 방향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이런 흐름이 우려스럽다. 권력은 해체하더라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왕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백성의 지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척, 신하 등 주변 인물들이 전횡을 일삼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공간만 넓어진다. 권력의 빈자리에서 온갖 도둑이 날뛰고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며 나라를 어지럽혔던 군약신강의 시대,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그런 시대를 닮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이 8일 제3차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당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뉴스1
과거엔 김영삼·김대중 등 걸출한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들은 시대적 요구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재야인사, 법조인, 운동권 학생 등을 영입해 자당의 인물로 내세웠다. 1994년 '민중당 3인방'을 영입한 YS나 16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피'들을 대거 수혈한 DJ는 그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감동을 주었다. 이후 당 총재가 사라지고 당원들의 권한은 대폭 늘었다. 그러나 정치가 나아졌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때의 낭만과 풍류마저 사라졌을 뿐이다.
물론 단위가 큰 대통령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두루 반영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여론을 살핌으로써 국민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가 낮아질수록 선거는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시·구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은 거의 없다. 이땐 강성 당원들의 조직된 표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린다는 건, 그들을 핑계로 내 의사는 관철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룰을 빌미로 반대 계파를 밀어낼 때나 이낙연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을 내보낼 때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당내에서 당원들의 권한은 계속 확대되었지만, 민주성이 보장되기는커녕 책임정치만 실종되었다.
당대표가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게 최선책은 아니다. 쌍팔년도 '보스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양극화되어가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할 차선책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내년 총선도 윤심이 어디에 있니, 누구 계파이니 하며 줄 세우고 사실상 내정해 당원 표를 몰아줄 텐데 뭣 하러 권한 나누는 척하나. 차라리 각 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해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 대신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건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책임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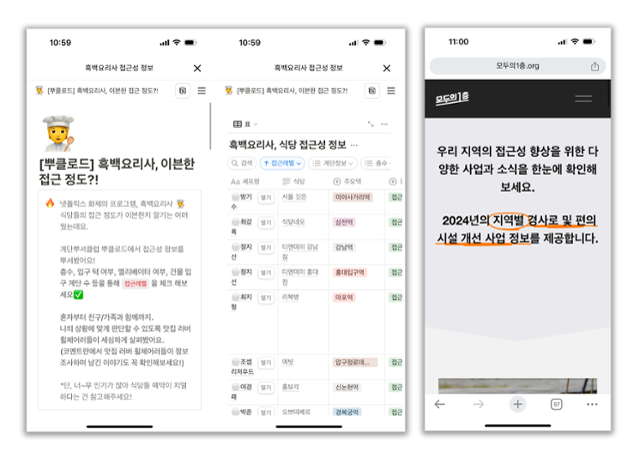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