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시흥동 교제여성 보복살인 피의자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폭력 사건에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극단적 비극을 앞둔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잦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 시흥동 교제여성 보복살인사건 때도 그랬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26일 새벽 5시 40분께 가해자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20여 분 만에 추가범행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 경찰은 가해자 무방비 귀가에 대해, 가정폭력도 아닌 데다 스토킹이라고 볼 만한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범행 예방조치가 가동되는 관련법 적용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아울러 피해자가 귀가 보호조치나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일반 폭력사건에서 경찰은 대개 쌍방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관용적 의사를 밝혔을 여지가 있다.
▦ 교제폭력 등에서 신고에 나섰던 피해 여성들이 왜 정작 처벌 불원이나 합의를 택하는지에 대해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의 관용적 입장을 액면 그대로 접수하는 건 무리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게 실질에선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와 편의, 여성성과 관련될 법한 용서와 포용 성향, 감정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위험한 선택’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 지난달 31일 나온 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의 판결은 교제폭력 사건에서 흔한 피해ㆍ가해자 간 합의, 선처탄원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주목할 만한 통찰을 보여줬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각성 필요를 우선 환기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진정으로 가해자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도 숙고해야 할 판결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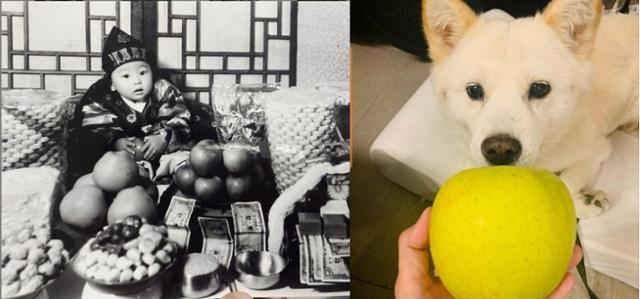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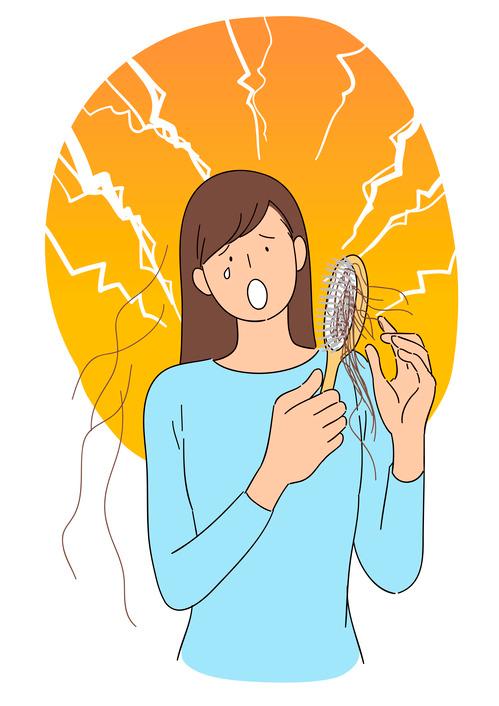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