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구 산동네에 서서히 해가 저물면 언덕배기의 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진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부산 영도구 산동네에 서서히 해가 저물면 언덕배기의 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진다. 과거 부산항으로 들어오던 외국인 선원들이 영도 산동네의 야경을 이탈리아 나폴리에 비유하곤 했단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화려한 산동네의 풍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빈집이 늘었고, 한밤중에도 불 꺼진 집이 많아졌다.

부산 영도구 산동네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났다. 재개발로 곳곳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풍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영도구는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전국의 50개 소멸우려지역 중 하나다. 생활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한 까닭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생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달동네 이미지에서 탈피해 이름 있는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문을 닫았던 공장이 새로운 카페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버려진 선박수리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 영도구 산동네에 서서히 해가 저물면 언덕배기의 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진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겼다. 조용하고 작은 동네에 비해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버투어리즘(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모처럼 특수에 기대려는 개발 붐에 마을 골목은 공사장으로 변했고, 촌스럽지만 정감 어린 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마을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해가 저무는 산복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로등이 햇빛을 대신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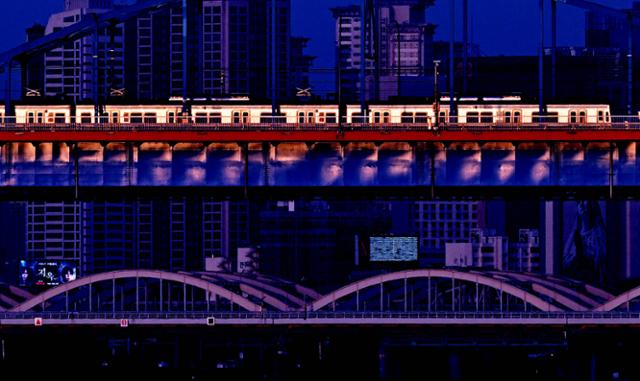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