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세계 끝의 버섯'

'오픈티켓'은 버섯 구매 행위 중 하나의 명칭이다. 채집인은 숲에서 돌아온 후 저녁에 크기와 성숙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등급'에 따라 각 버섯의 무게당 가격을 받고 구매인에게 버섯을 판다. 채집 단계까지만 해도 송이버섯은 노동과 사람이 분리된 '소외된 상품'이 아니지만, 구매인의 분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상품'으로 변모한다. 현실문화 제공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파괴됐을 때,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던 폐허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송이버섯이라고 한다. 핵폭발 이후에도 잡초처럼 쑥쑥 자랄 정도이니, 인간의 발달한 경작 기술을 동원한다면 대량 생산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아마 그게 가능했다면, 이 버섯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버섯'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달에도 착륙하는 인류가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송이버섯 재배다. 송이버섯은 숲의 다른 나무들과 공생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송이버섯을 무척 애호하는 일본이 양식을 위해 수백만 엔을 들여 노력했지만, 이 생명력 강한 버섯은 끝끝내 인위적인 환경에 저항했다. 송이버섯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반구 전역에 걸쳐 다양성을 확보한 숲의 역동성과 서로의 존재가 얽혀 성장하며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생태적 관계다. 이 설명하기 어렵고, 인위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오염된 조건'에서 송이버섯은 쑥쑥 자란다. 이를테면 심각한 산림 벌채가 행해진 곳이나, 빙하, 화산, 모래언덕 혹은 나무와 유기질 토양까지 없어져버린 장소.
책 '세계 끝의 버섯'은 '송이버섯 상품사슬' 대장정이라 볼 수 있다. 송이버섯이라는 균류이자 식재료가 자라고, 채집되어, 분류되고, 경매에 부쳐져 끝끝내 일본의 미식가와 애호가들이 주고받는 고급 선물 세트에 담기기까지의 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저 송이버섯이 어떻게 채집되어 상품으로 거듭나는가를 다뤘다면, 이 책은 송이버섯 백과사전 같은 유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책이 2015년 초판 발행 이래 "인류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칭송을 얻은 것은, 송이버섯 상품사슬에 연루된 모든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계획된 행동뿐 아니라 불확실성 속 우연까지도 면밀히 관찰하여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은 유기체를 통해 자본주의적 파괴와 기후비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협력적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인류학적 주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깊이 탐구하는 글에 수여하는 상인 '빅터 터너상'을 2016년에 수상한 책이 최근 국내에 번역돼 출간됐다.

저자 애나 로웬하웁트 칭은 글로벌 자본주의를 환경, 생태, 풍경, 다종민족지와 같은 생태인류학적이고 포스트휴머니즘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류학자다. 현실문화 제공
인류학자 애나 로웬하웁트 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중국, 핀란드에서 송이버섯 시즌 동안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덴마크, 스웨덴, 튀르키예 등의 과학자, 산림관리인, 송이버섯 무역업자 등을 만나 '송이버섯'을 추적했다.
7년간의 여정은 미국 오리건주의 캐스케이드산맥으로 송이버섯과 송이버섯 채집인을 찾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죽어가는 숲'이라 묘사할 정도로 로지폴소나무 외에 풀도 자라지 않는 이 숲에서 저자는 송이버섯 채집인이 된 동남아 난민과 백인 참전 용사, 중국 윈난성 소수민족의 염소 목동, 핀란드의 자연 가이드 등을 만난다. 또 캐나다 밴쿠버의 송이버섯 분류 동남아 이민자를 비롯하여 일본 도쿄 경매 시장 등 중간 유통 과정을 목격한다. 민족, 전쟁과 자유, 자본주의 등 인류사의 거대 개념을 '송이버섯 추적기'로 꿰어내는 시각이 탁월하고 새롭다.
'세계화된 송이버섯의 세계'에는 옳고 그름,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인간과 비인간 같은 이분법이 발 디딜 틈이 없다. 그저 변화무쌍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다성음악 다운율의 리듬을 타듯 들려주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씨줄과 날줄로 직조하여 보여줄 뿐이다.
역자는 해제에서 인간예외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내재한 인본주의를 비판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인류학의 흐름을 제시하며 "근대 사회의 통념과 달리, 다종의 민족지(다수의 생물종이 마주치고, 얽히고, 충돌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의 삶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적 방법)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비인간 생물이 문화를 건설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책은 송이버섯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위계 없이 마주치고, 얽히고, 충돌하며 만들어가는 협력적 생존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장장 544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의 마지막 목차 제목은 '끝맺음에 반대하며'다. 일종의 '열린 결말' 이다. 명쾌한 끝을 고대하며 페이지를 넘겼을 독자는 다소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책을 덮자마자 마치 강한 솔향 머금은 송이버섯을 따러 황폐화한 숲으로 들어갔다 나온 듯한 생생한 감각에 사로잡히고, 척박하고 불확실한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와 관계 맺는 송이버섯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의 불꽃이 점화될지도 모른다.

송이버섯은 나무와 공생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척박한 곳에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송이버섯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 교란이 일어나고 있어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현실문화 제공

세계 끝의 버섯·애나 로웬하웁트 칭 지음·노고운 옮김·현실문화 발행·544쪽·3만5,0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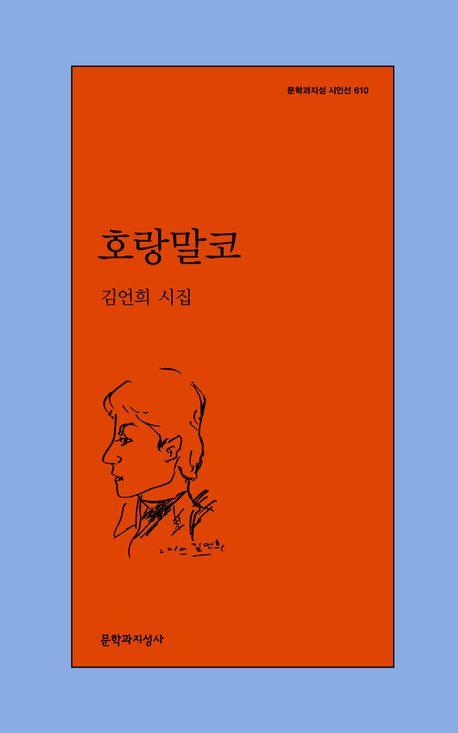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