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말 놓을 용기'

말 놓을 용기·이성민 지음·민음사 발행·208쪽·1만6,000원
"한국말에는 이제 반말과 존댓말이 있고, 또한 평어가 있다."
일찍이 이런 선언은 없었다. 위계화된 사회에 최적화된 어법을 거부하고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언어 표준을 만들겠다는 선언. 기존 질서에서 탈피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보편화하는 현상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다면, 철학자 이성민(56)이 내놓은 신간 '말 놓을 용기'는 뉴노멀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자가 제안한 '평어'는 '이름 호칭+반말'이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동등하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는 화법이다. 이름에선 성을 떼고 '○○야', '○○아'로 부르지 않으며 '너'라는 표현은 피한다. 예를 들어 김혜진이라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반말을 하거나 "김혜진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존댓말로 묻지 않는다. 이름과 반말만 사용해 "혜진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이 평어 화법이다. 반말과 존댓말로 양분된 기존 어법은 상하관계를 반영했다면 평어는 수평적 관계를 전제한 상호 존중의 언어다.

'말 놓을 용기'의 저자 이성민에 따르면 '평어(이름+반말)'는 생물학적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 대화에 집중하는 언어다. 이른바 예의와 존중이 담겨있는 '상호 반말'로, 어린 시절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또래 문화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어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한국어로 극복한다(김진해 경희대 교수)"는 평을 받는 평어의 경쟁력은 새로운 문화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서로 나이와 경력을 공유하고, 그에 걸맞은 호칭을 정리한 뒤 예절을 갖춰 대화를 나누는 문화에 익숙하다. 저자는 그토록 강고한 문화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무엇이 한두 살 나이를 민감하게 따지며 호칭을 나누게 만드는 것일까 따져봤더니 도무지 문화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두 살 나이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 또래 관계를 소환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 시절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연했으며 자유로웠던가. 바로 그 또래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 소멸해 버리는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지 못했던 탓이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나이와 경력을 넘어 관계의 아름다움을 복원할 도구로써 저자가 개발한 언어는 이미 구체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자 본인이 '디학'(서울 을지로 소재 디자인 대안학교)에서 수업하면서 평어를 쓰고 있고, 해당 책을 출간한 민음사는 '회사에서 평어 쓰기'를 실천 중이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진해 교수는 '강의실에서 평어 쓰기'를 시도해 언론매체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평어가 안착한 사회의 여러 사례를 간접 체험하는 동안 독자의 호기심은 자연스레 확신으로 바뀐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사와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후배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선배와 눈을 마주치며 농담을 주고받는 유연하고 평등한 세상은, 평어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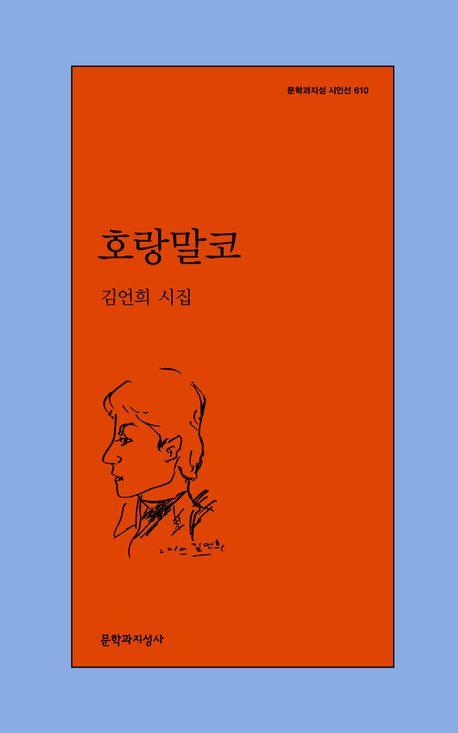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